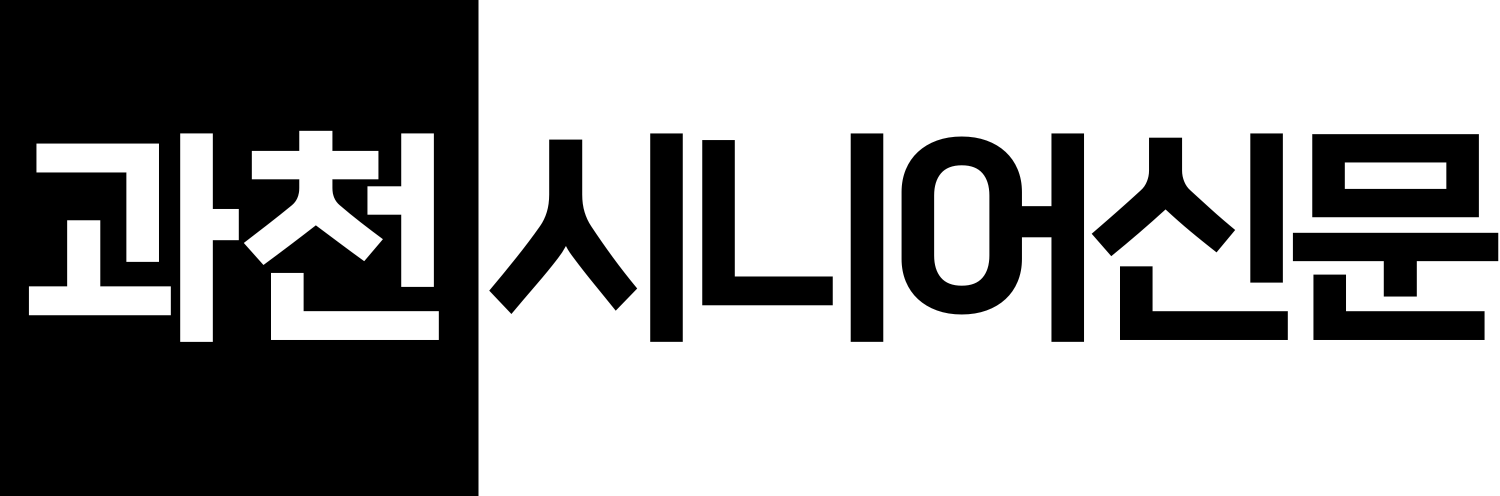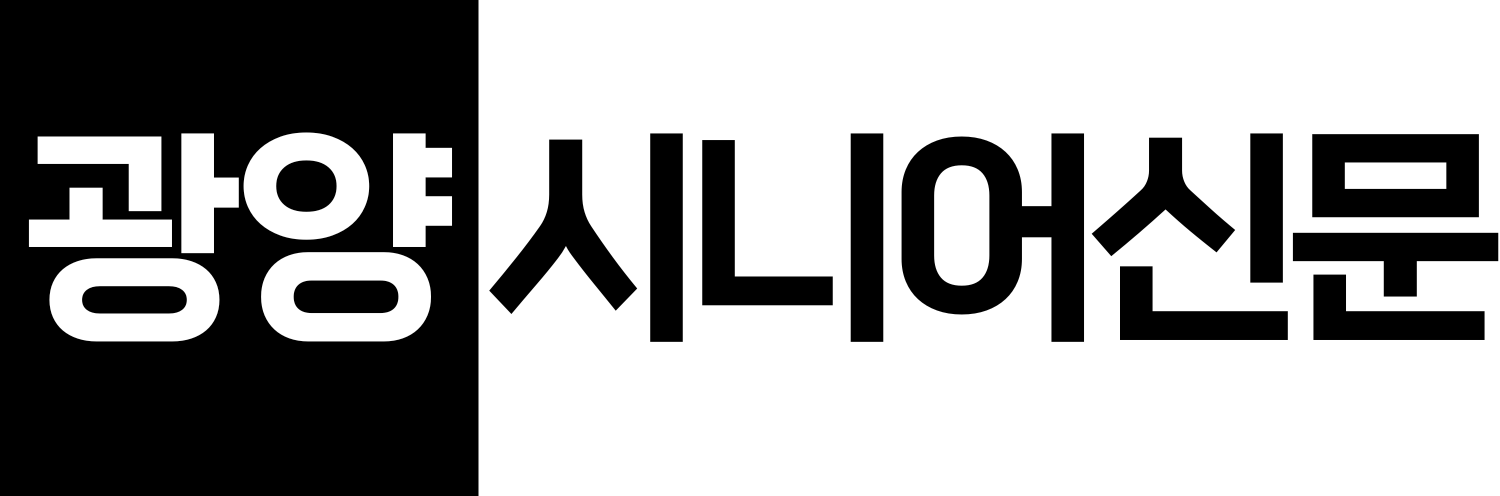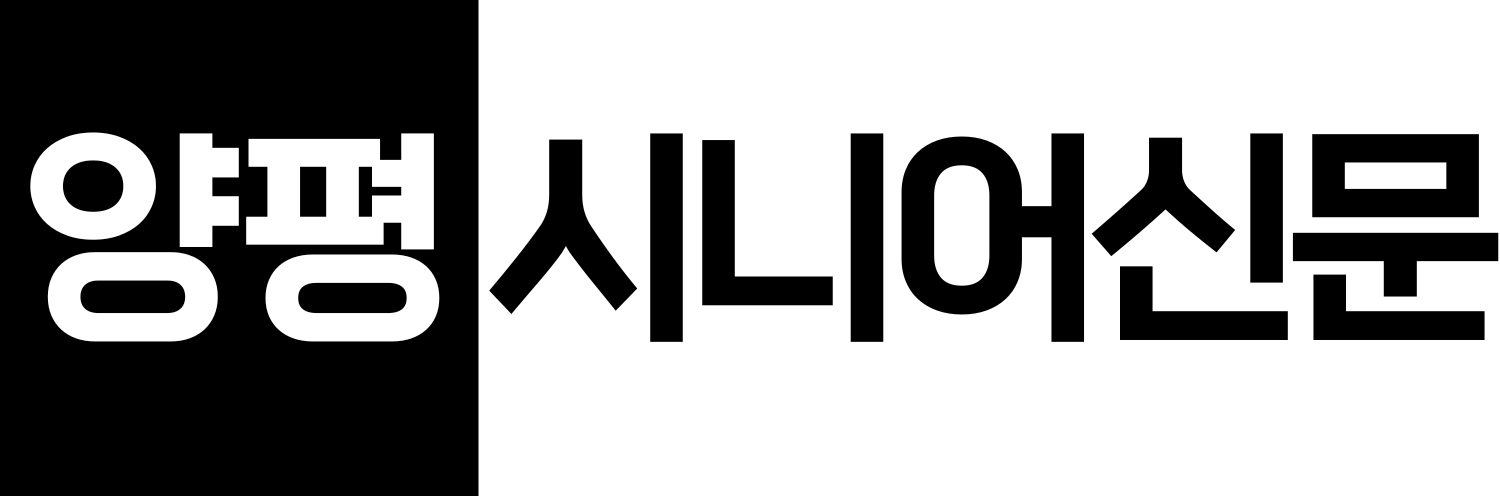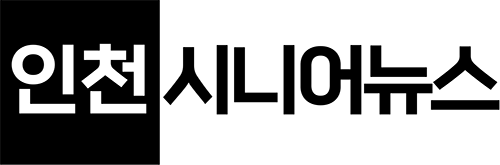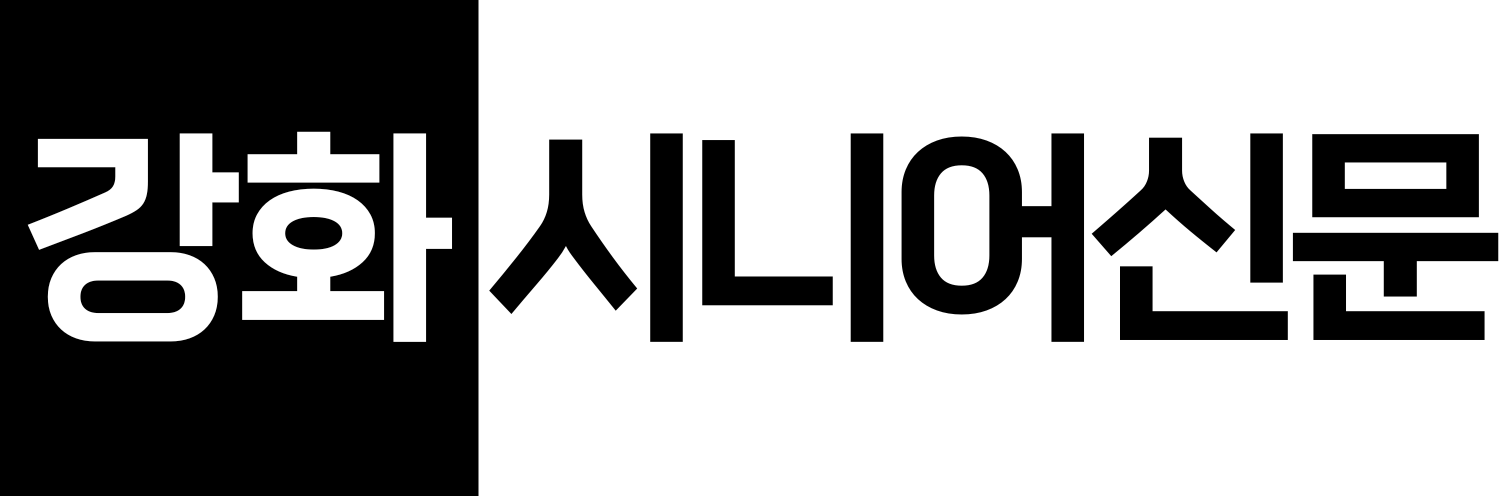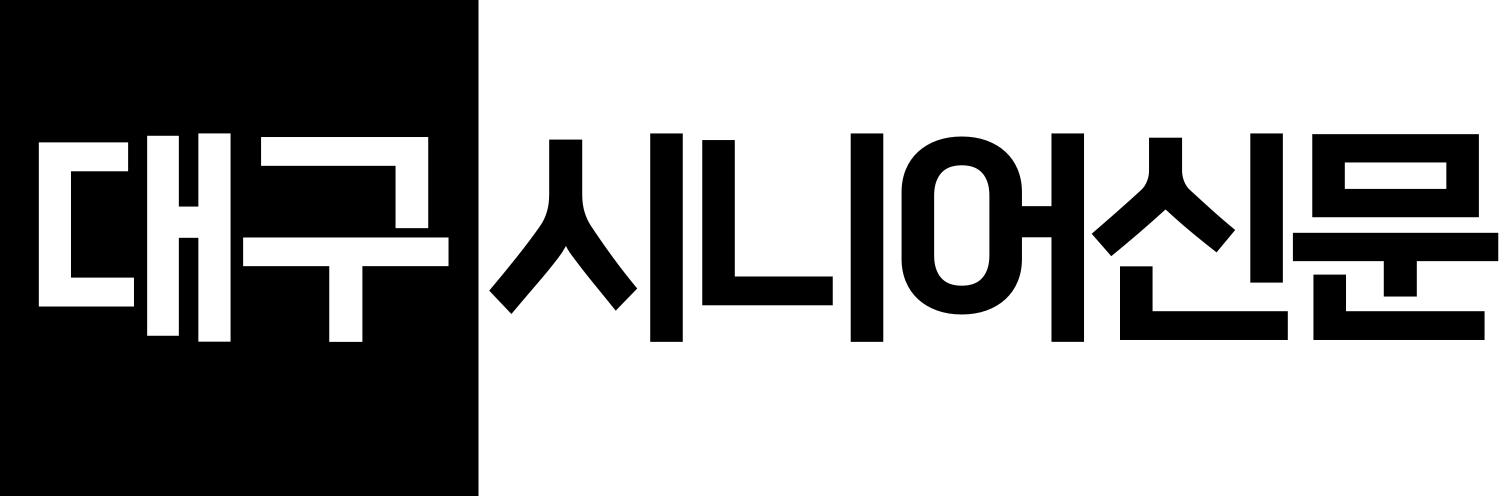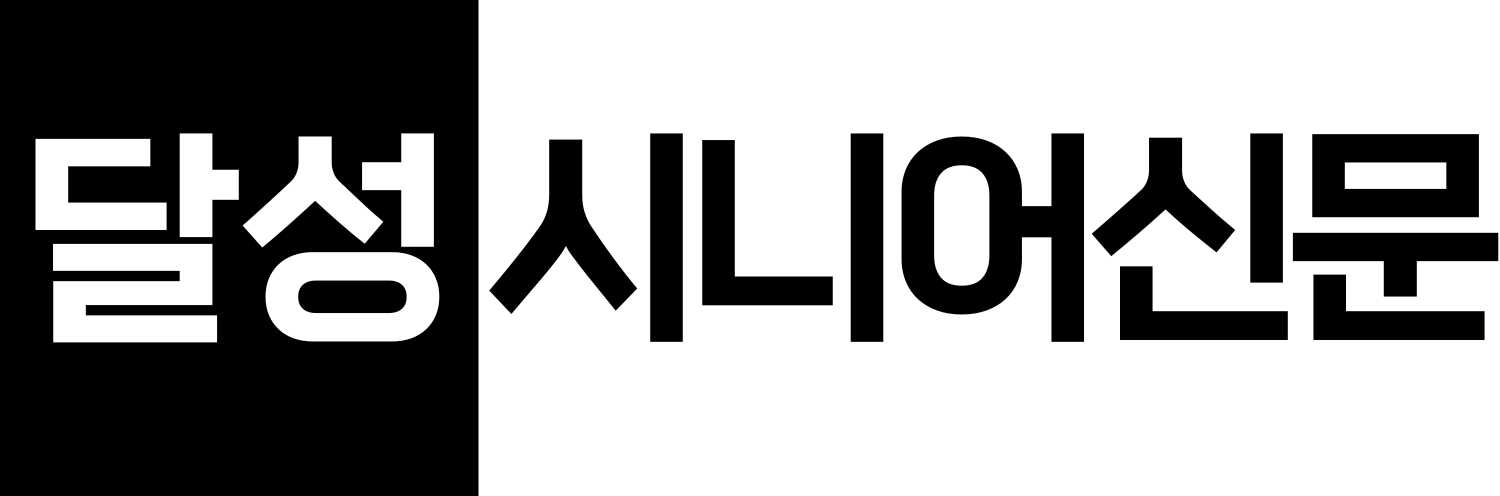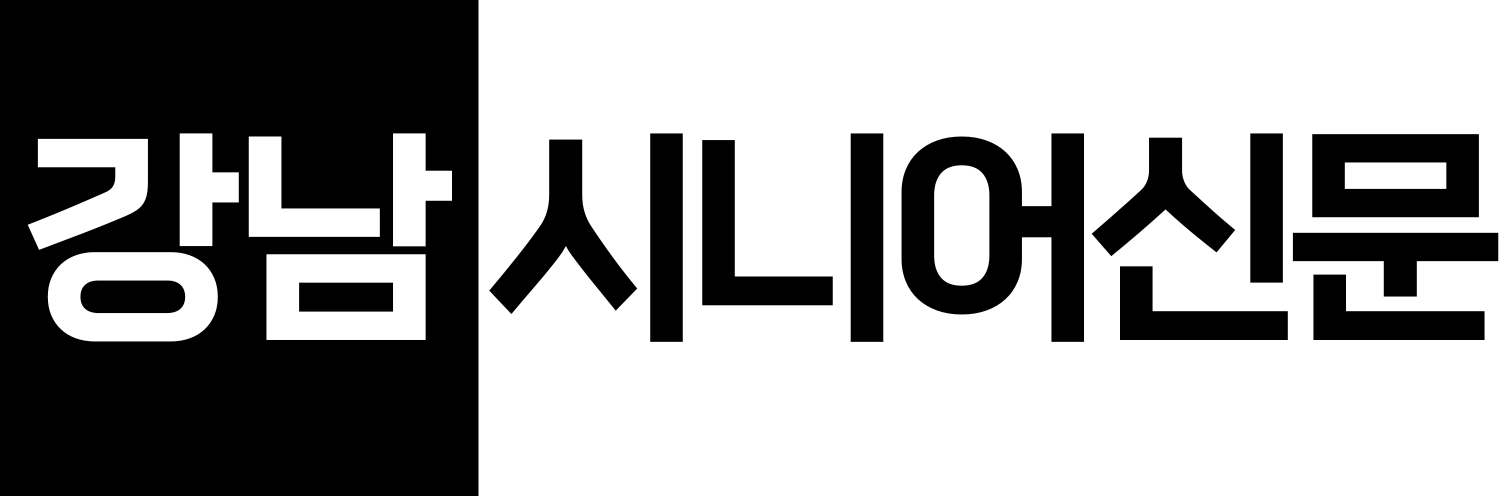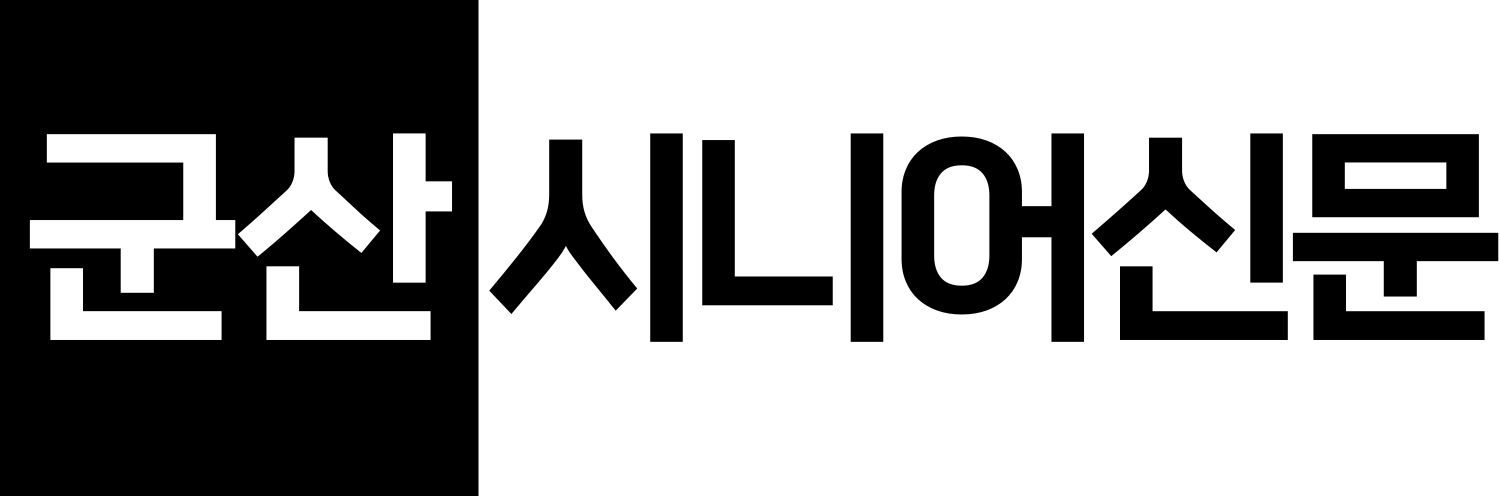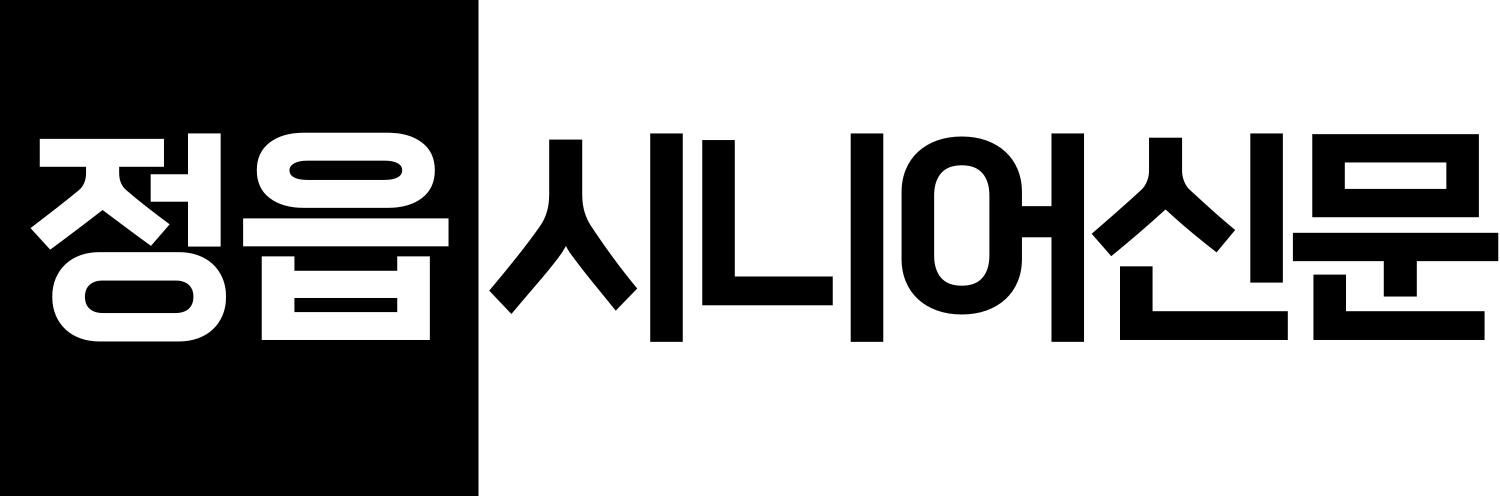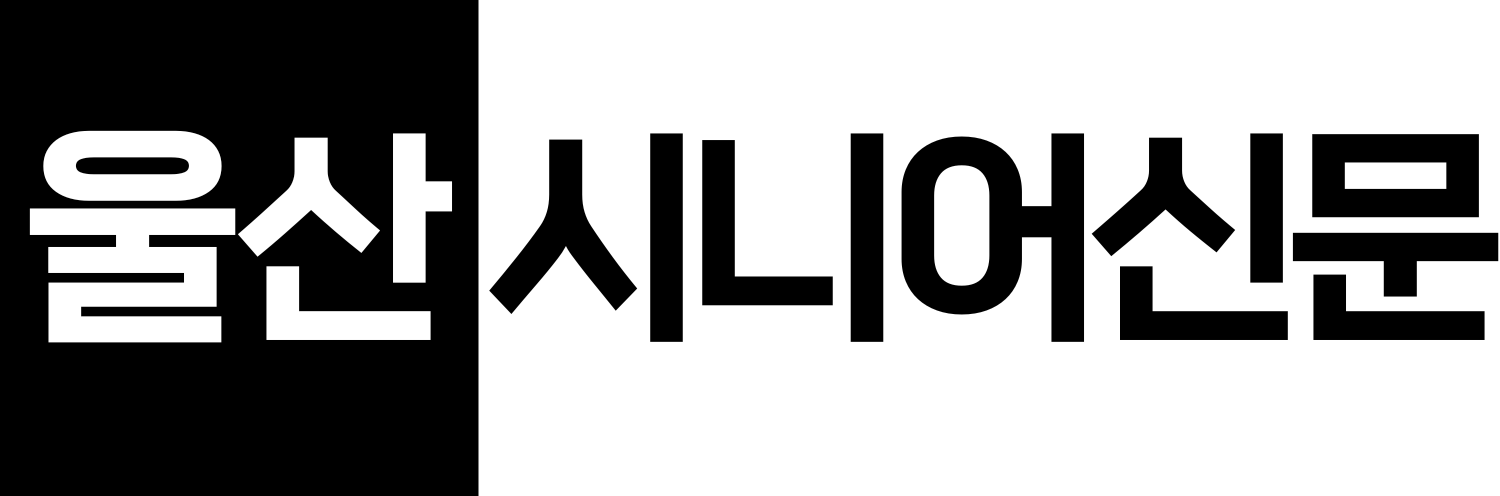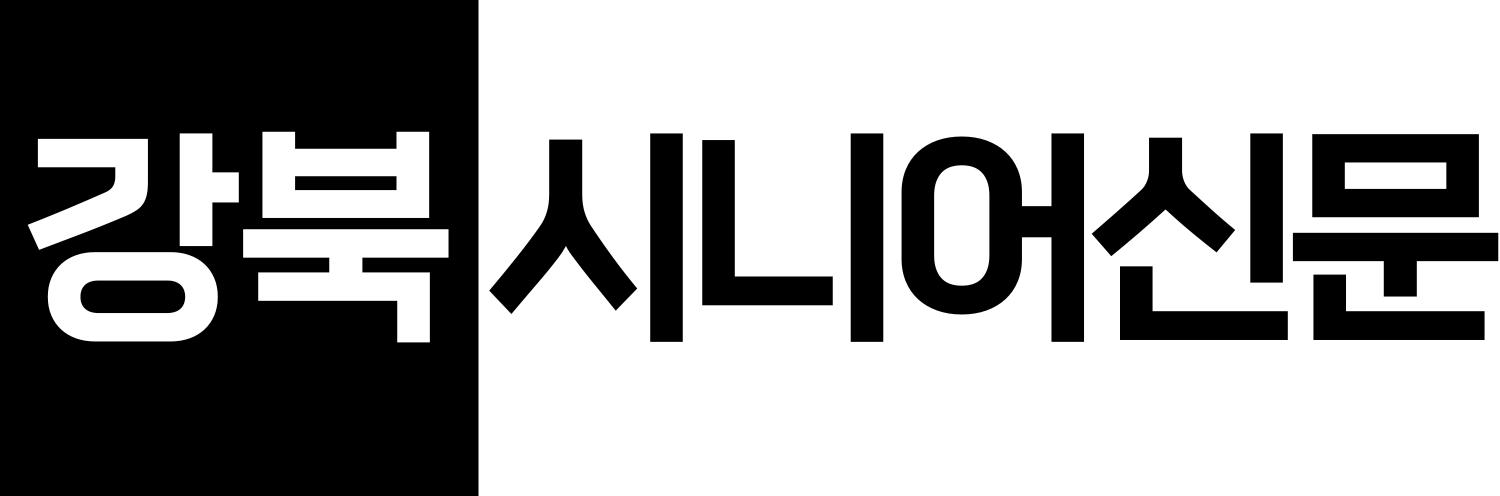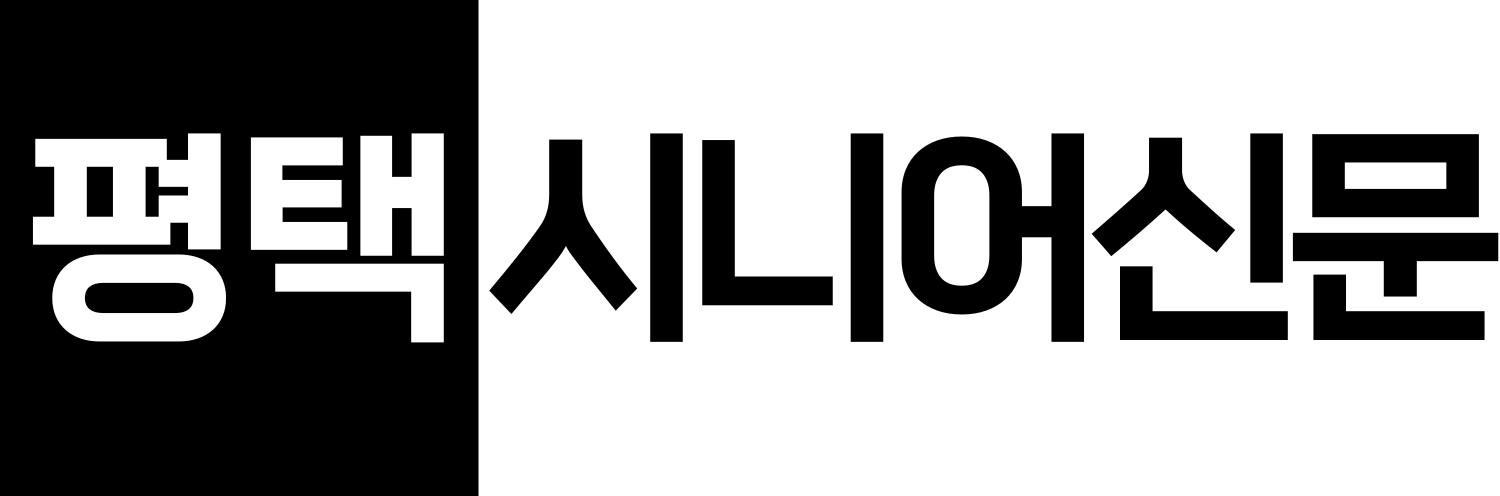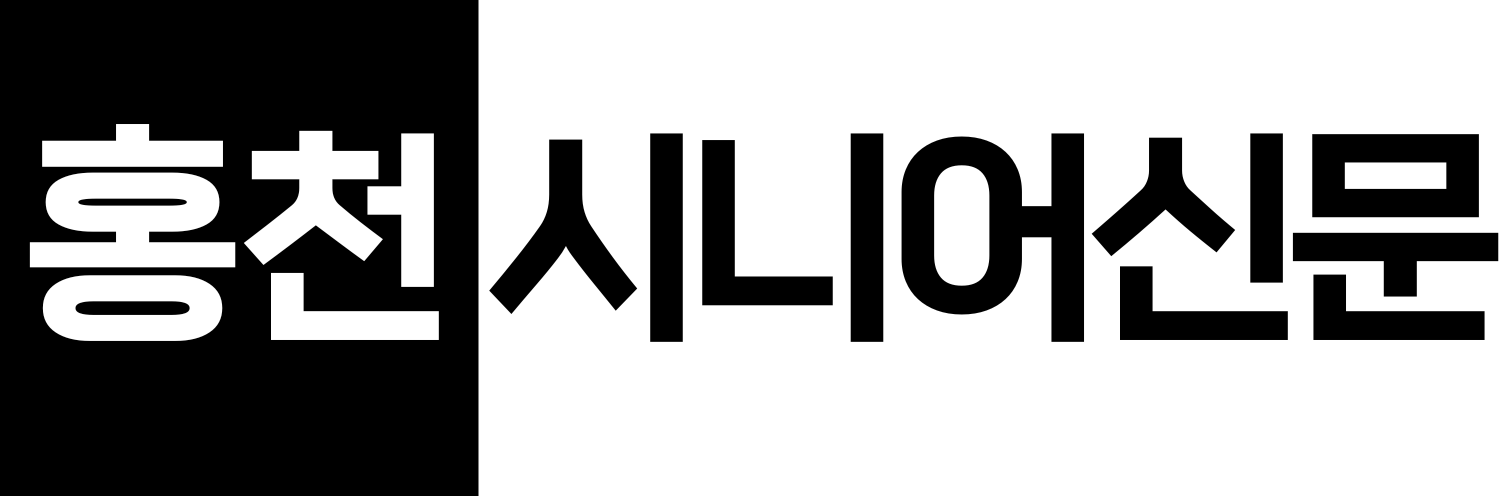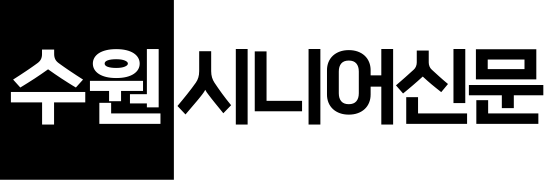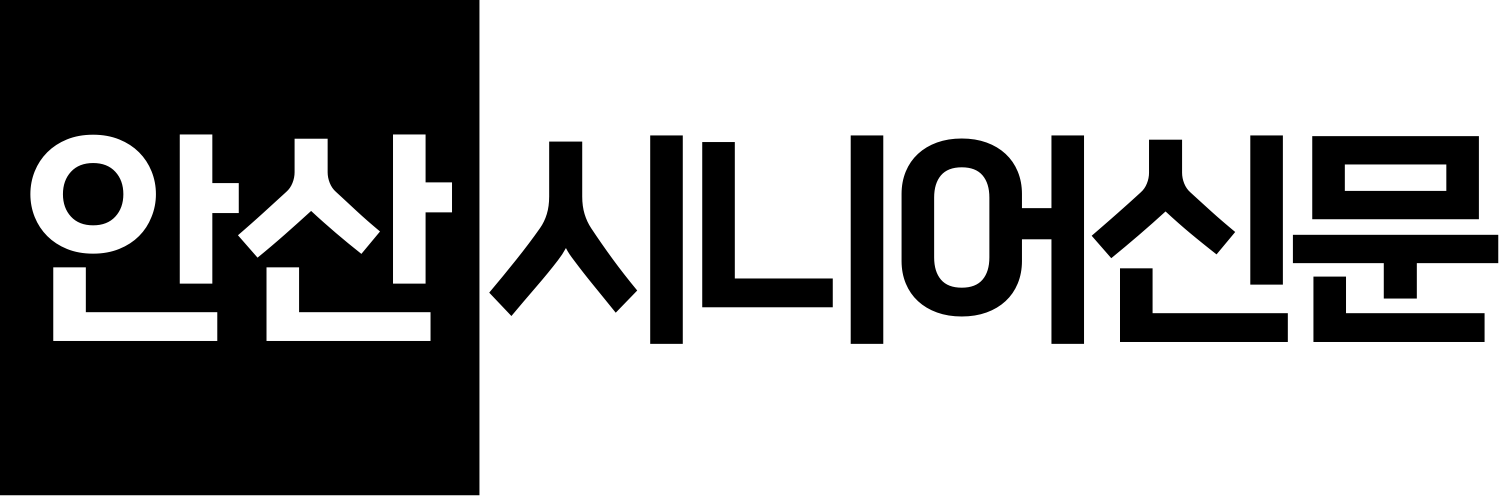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무섭게 쏟아지던 비가 멈추고 나니, 곳곳에 남겨진 상처가 참혹했다. 무너진 집들, 침수된 농경지, 끊어진 도로들. 그리고 그 속에서 터전을 잃고 막막해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다. 평생 일궈온 논밭이 진흙탕이 되어버린 농민들의 한숨, 하룻밤 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인들의 절망,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던 가족들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매미 소리와 함께 비치는 밝은 아침 햇살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일상을 비추고 있다. 이 야속할 정도로 고요한 일상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산을 깎아 아파트를 세우고, 강을 막아 도시를 만들며, 바다를 메워 땅을 넓혀왔다.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마치 우리가 자연의 주인인 양 행동해왔다. 공존이 아닌 파괴를 선택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처럼, 때로는 거센 경고의 목소리로. “공존만이 살길”이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자연 보호는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어떤 환경단체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며 살아왔다. 분리수거조차 귀찮아하고, 에어컨을 틀어놓고도 죄책감 없이 지내온 내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데 이번 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며 깨달았다. 평온한 일상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만 진정한 안전과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실천이다. 분리수거를 정확히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자연을 살리는 큰 힘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이 바로 공존의 시작이다.
재해는 반복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잦아지고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과 이웃과 진정한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그 어떤 시련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다. 파괴인가, 공존인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기자수첩] 삶의 노래로 피어나는 시니어 문화…‘전남 시니어 향토문화경연’을 보고](https://naju-senior.com/wp-content/uploads/2025/11/기자수첩-문화원행사-218x15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