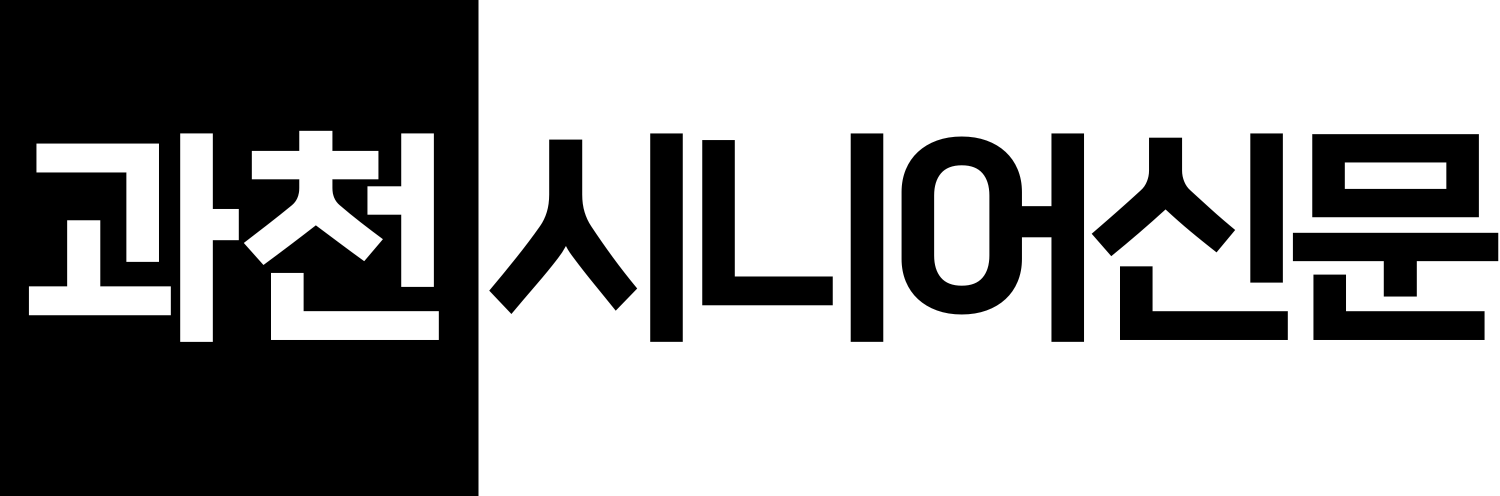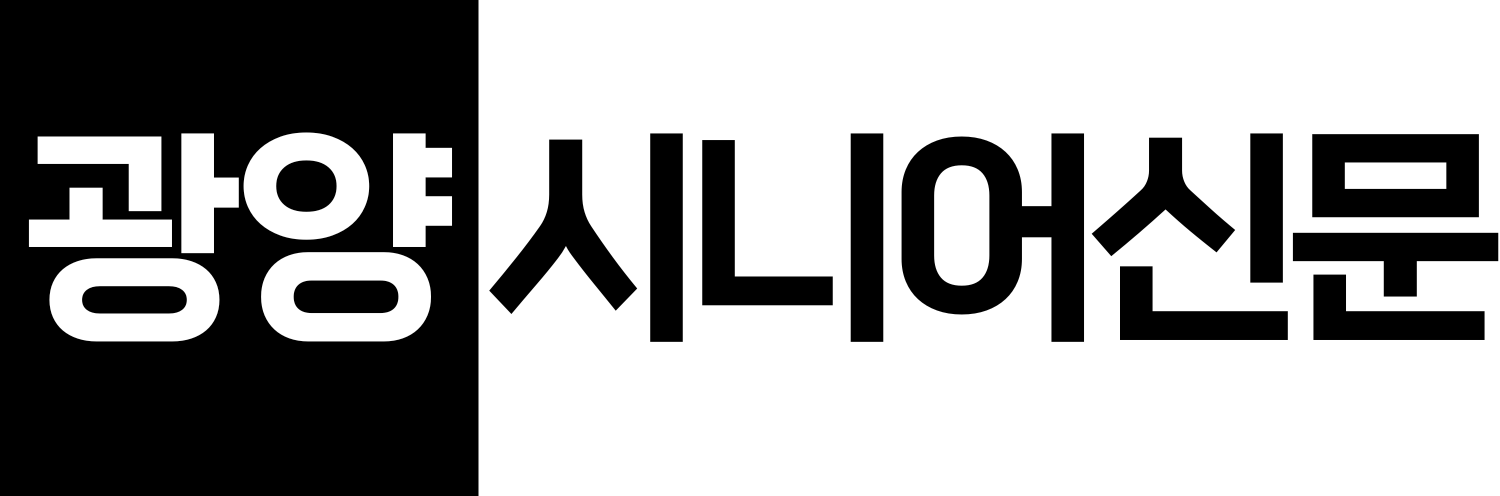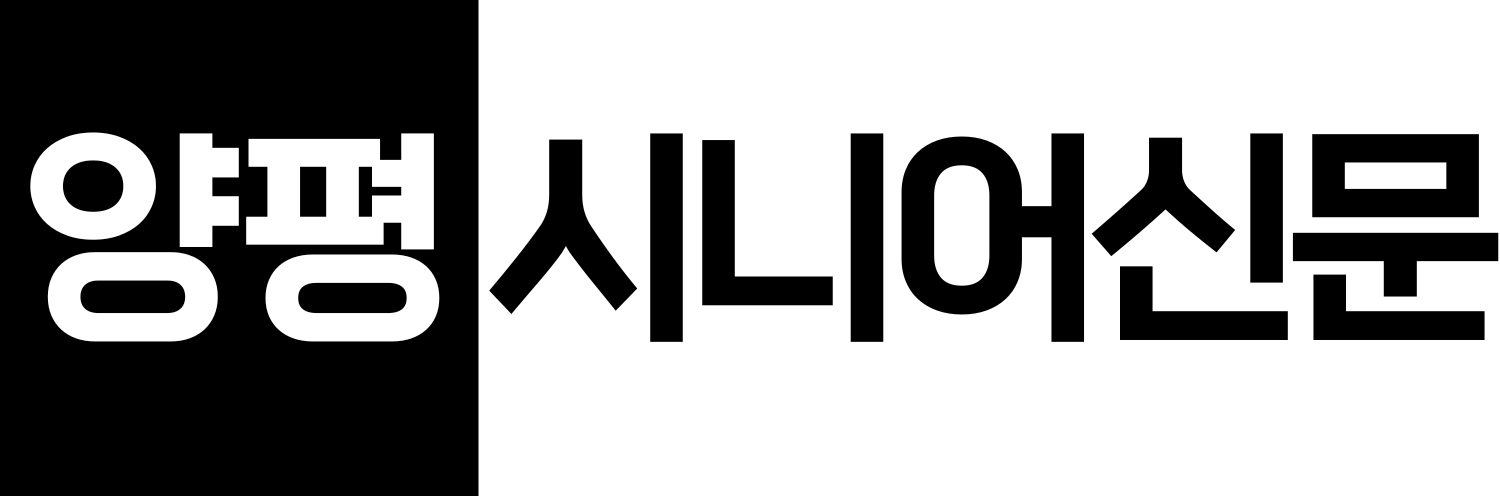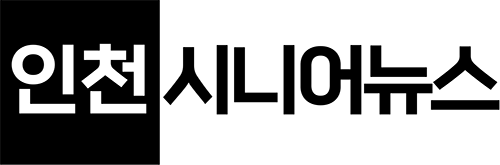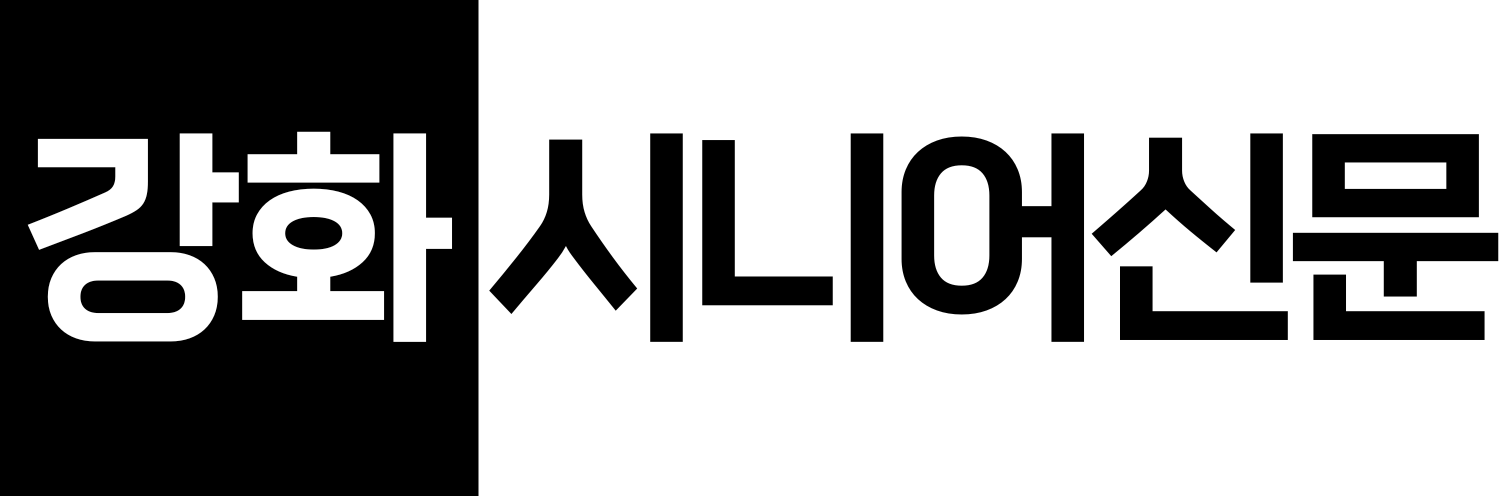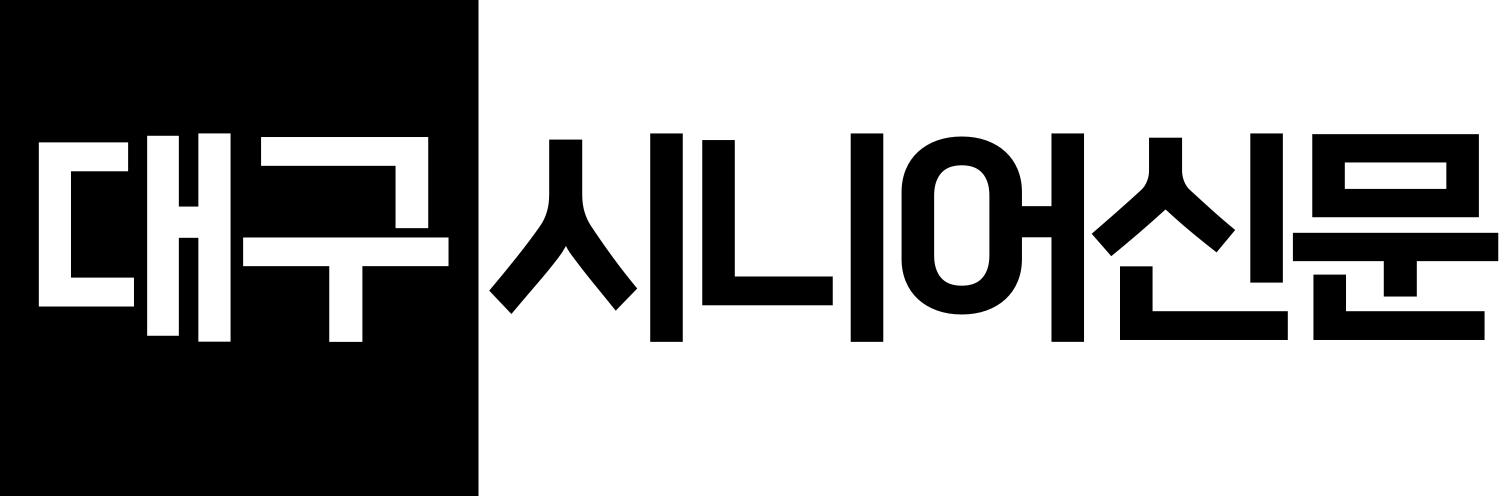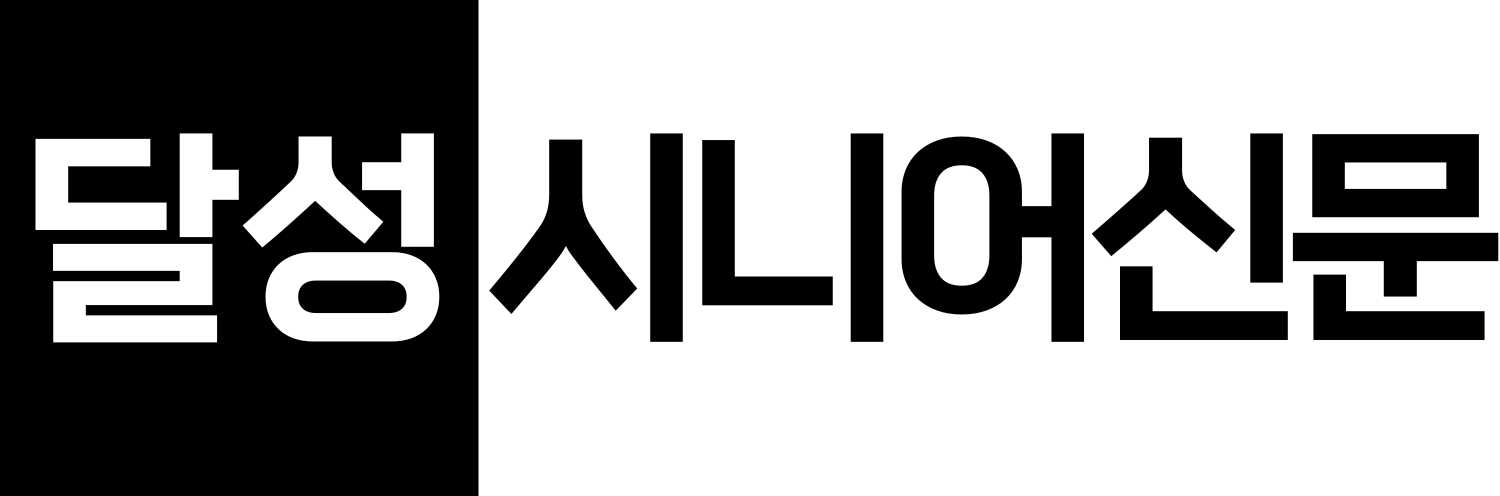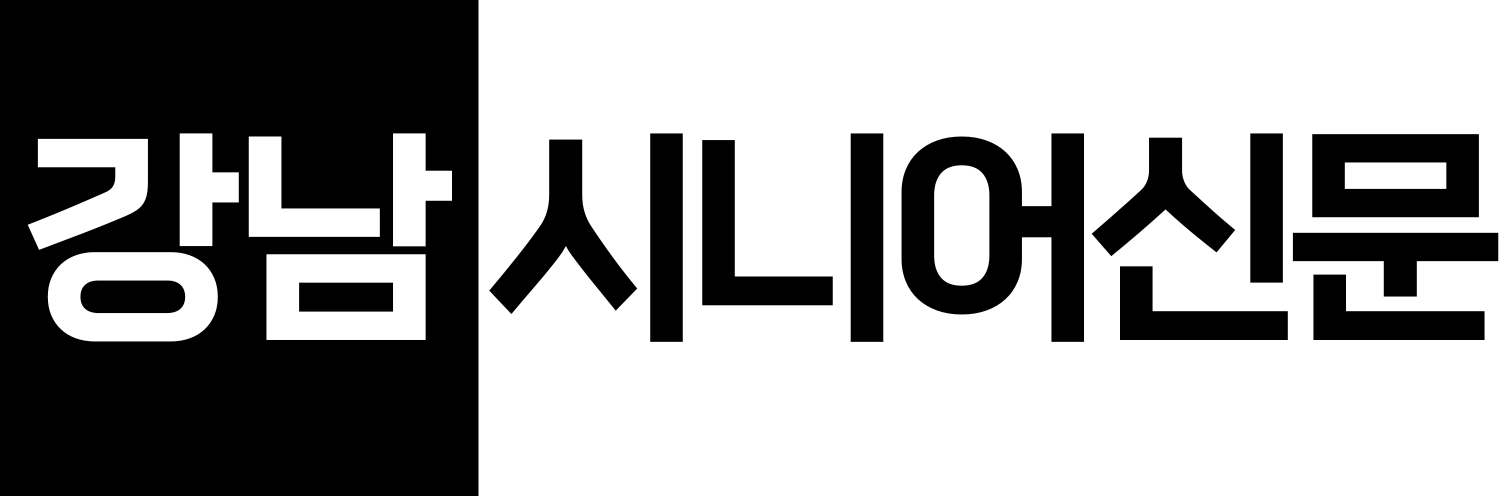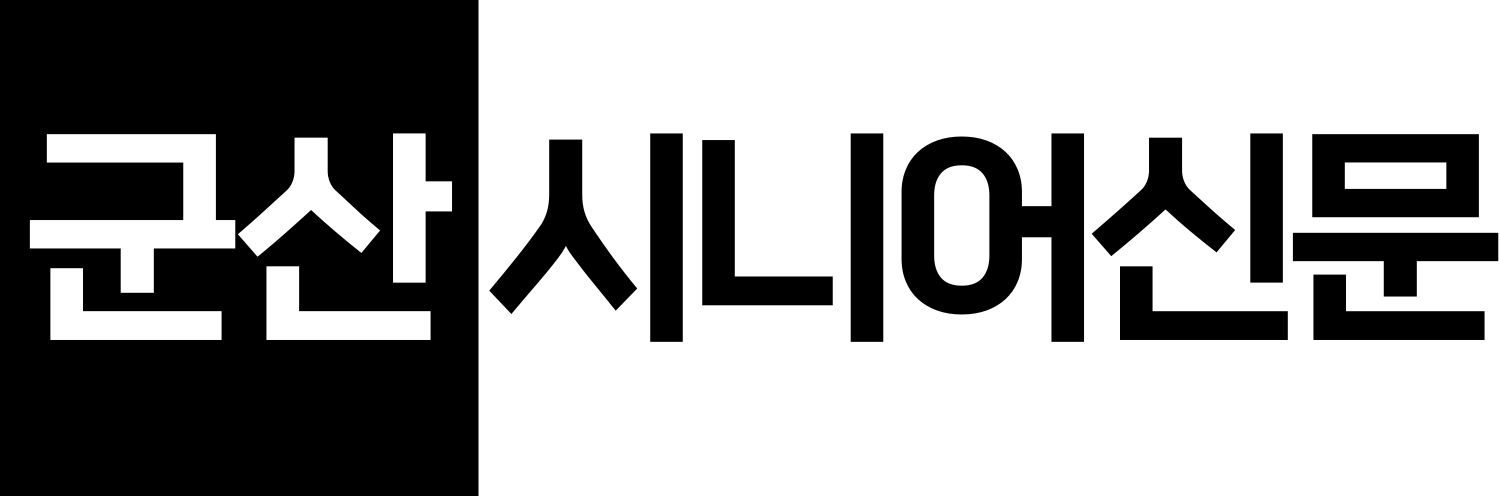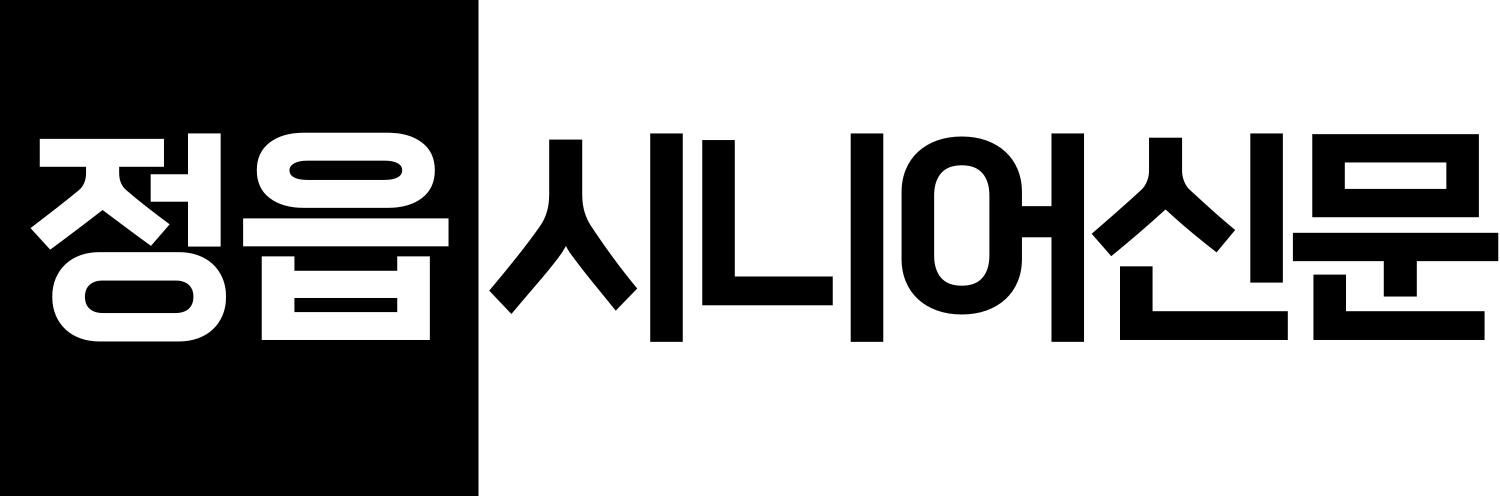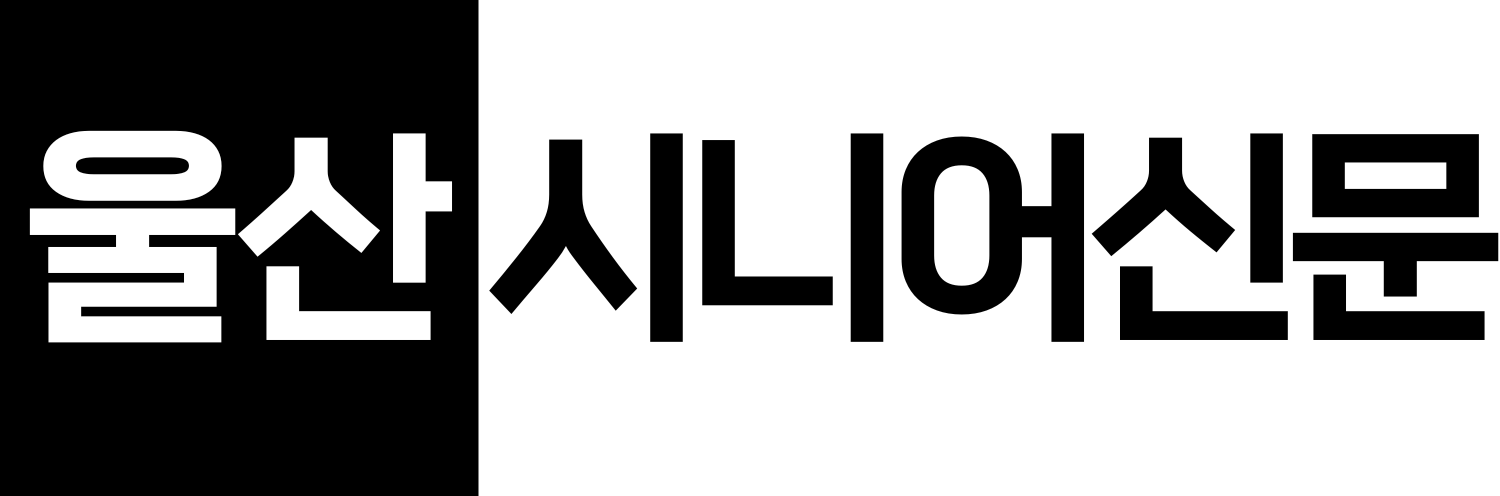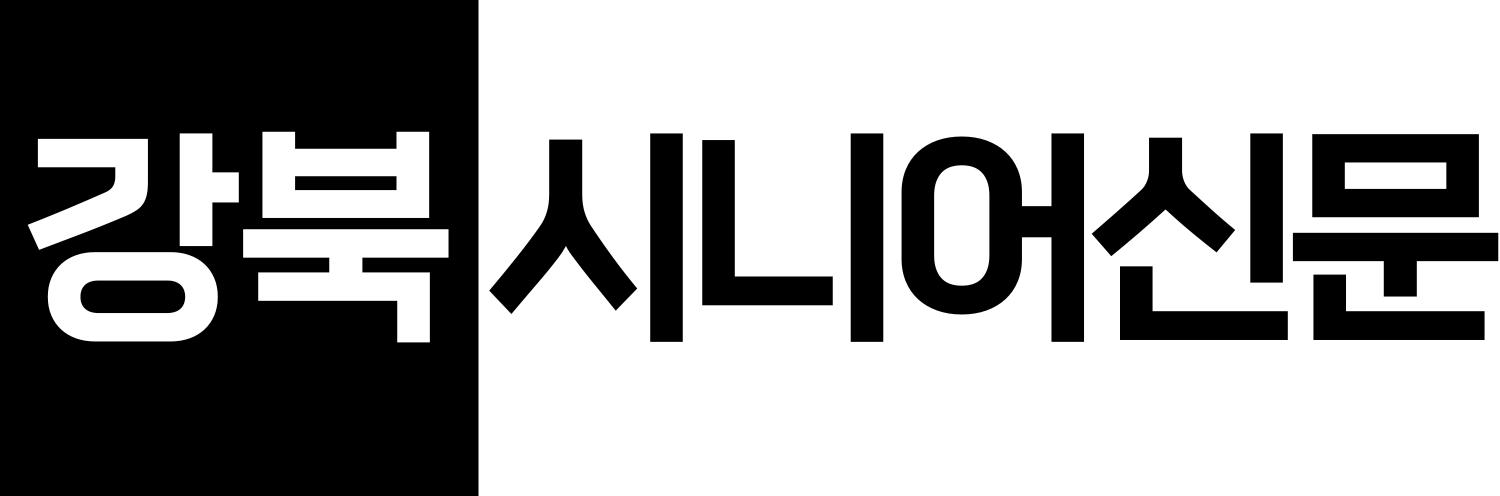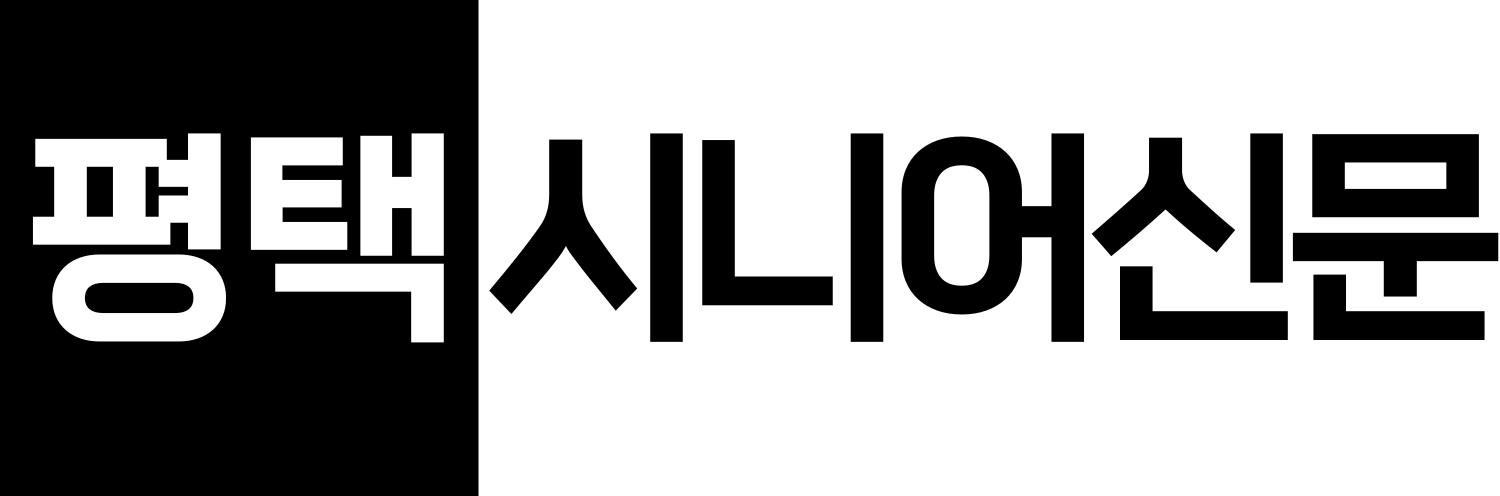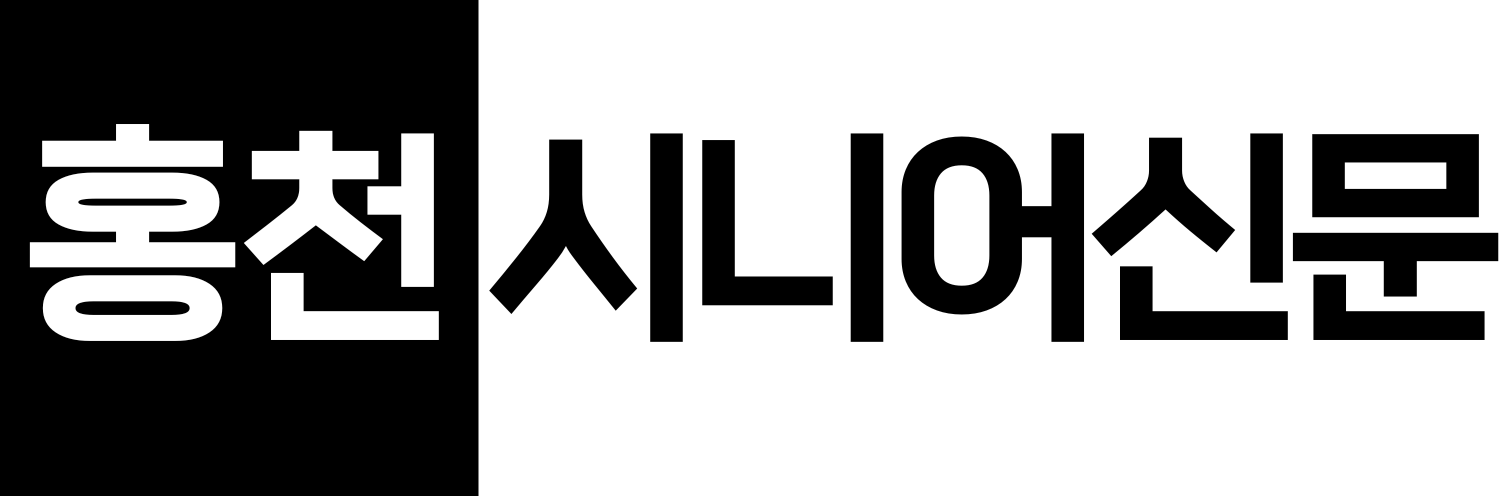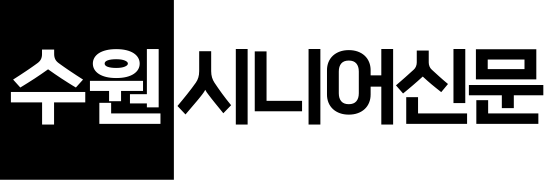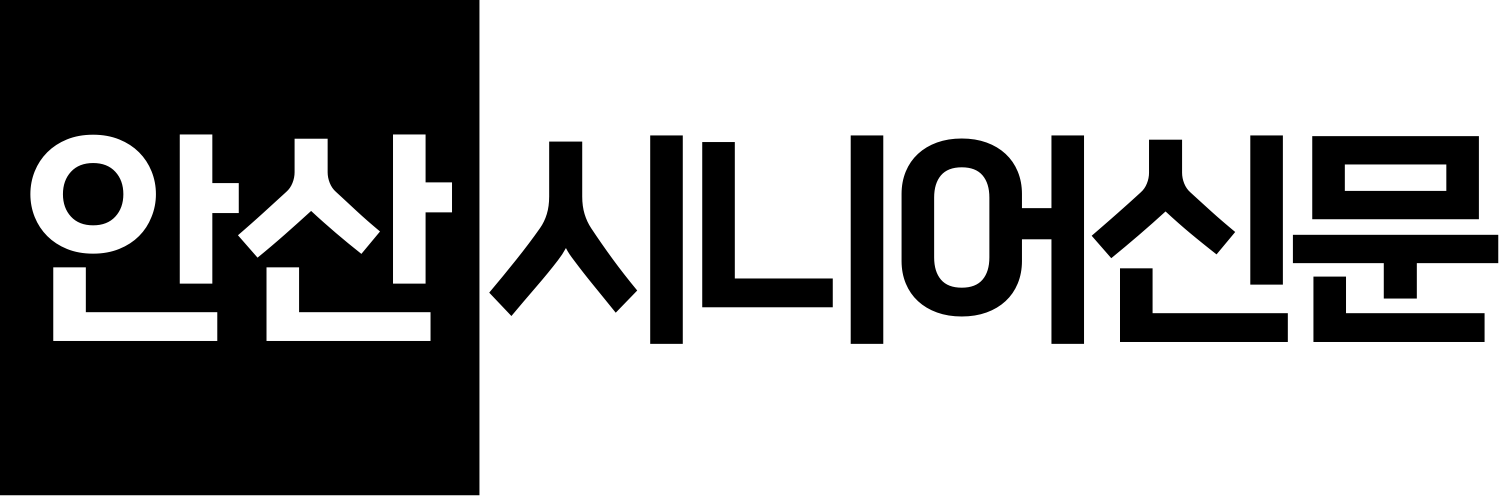15여 년 전, 도시의 회색 빌딩 숲을 벗어나 시골에 터를 잡았을 때, 우리 부부는 비로소 한 템포 느리게 숨을 내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흙을 만지고, 정원을 가꾸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전원생활은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원생활에 빠져들수록 본채가 조금씩 좁게 느껴졌고,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락방이 있는 조그만 별채를 하나 지어볼까요?”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둘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마다 우리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10평 남짓한 다락방이 있는 목조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 책을 연구하고, 자재상을 쫓아다니며 기초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하던 건축 용어들도 하나둘 익숙해졌습니다.
첫 번째 벽체를 세우던 날, 무거운 합판을 들고 수평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고, 저는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모한 거 아냐?”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수평계를 세 번 확인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지붕 경사를 재는 일도 쉽지 않았고, 단열재를 거꾸로 붙여 다시 뜯기도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자재상 사장님께서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다면 진작 포기했을 일이었습니다. 둘이서 하니 남편이 지쳐 쉴 때면 제가 힘을 냈고, 제가 주저앉고 싶을 때면 남편이 “조금만 더”라고 속삭였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별채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 손으로 빚어낸 기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못자국, 울퉁불퉁한 페인트 자국, 그 모든 흔적이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다락방을 오르내릴 때, 남편과 저는 말없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집에서 몇 해를 보냈습니다. 다락방은 작은 서재이자 음악실이 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마시던 오후들. 정원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현실적인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5년 전, 황혼육아를 돕기 위해 우리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집과 별채는 우리와 마음이 통하는 젊은 부부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사 트럭에 짐을 싣던 날, 다락방 창가에서 마지막으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다락방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꿈, 까만 밤하늘의 별똥별이 떨어지던 풍경,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벽체를 세우던 그 순간. 수평계를 세 번 확인하던 남편의 진지한 표정까지도. 그때의 구슬땀도, 온몸의 근육통도, 실패했던 순간들도 모두 진짜였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우리 부부에게, 그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별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서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혼자라면 힘들겠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희망은 두 배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꿈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우리를 찾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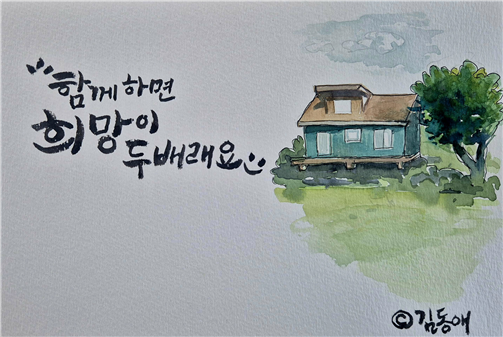


![[기자수첩] 삶의 노래로 피어나는 시니어 문화…‘전남 시니어 향토문화경연’을 보고](https://naju-senior.com/wp-content/uploads/2025/11/기자수첩-문화원행사-218x15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