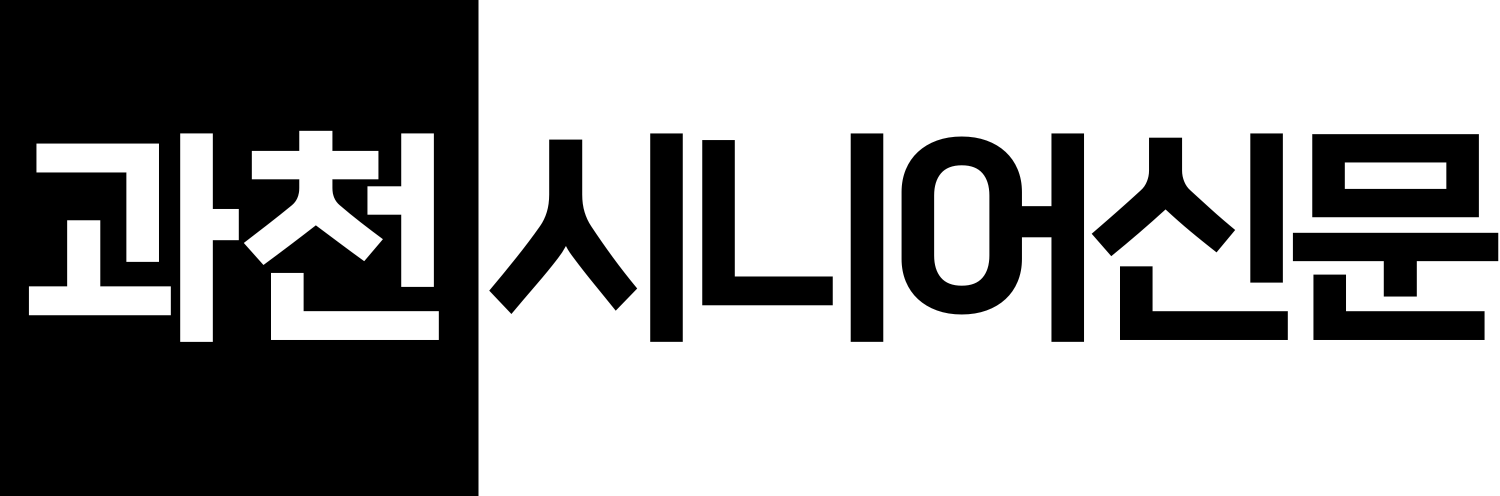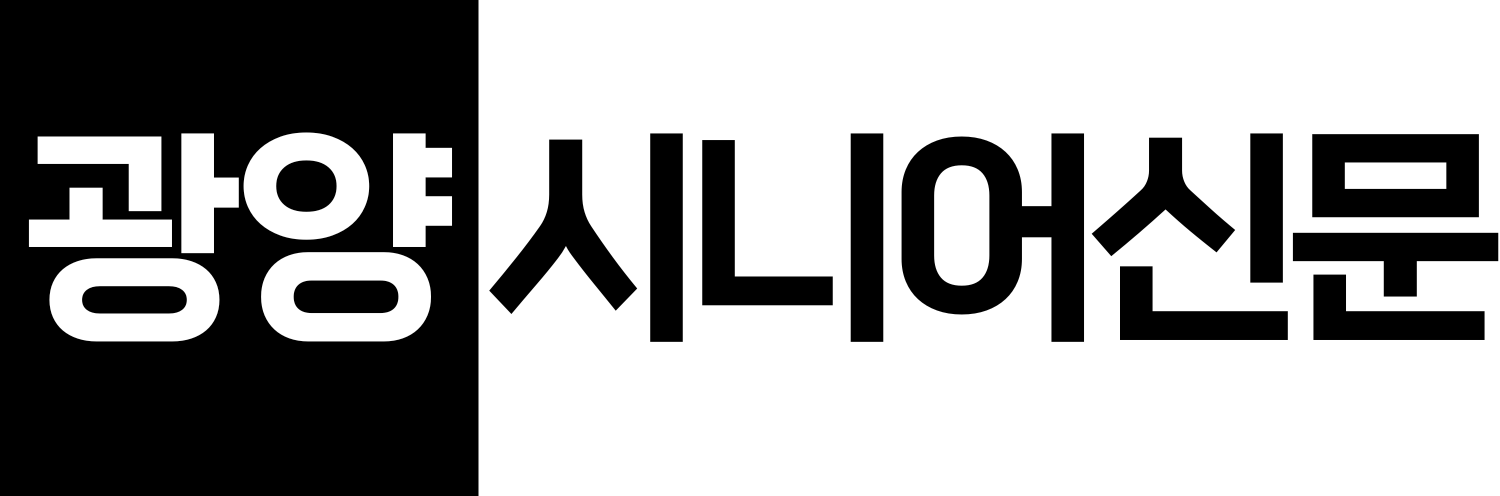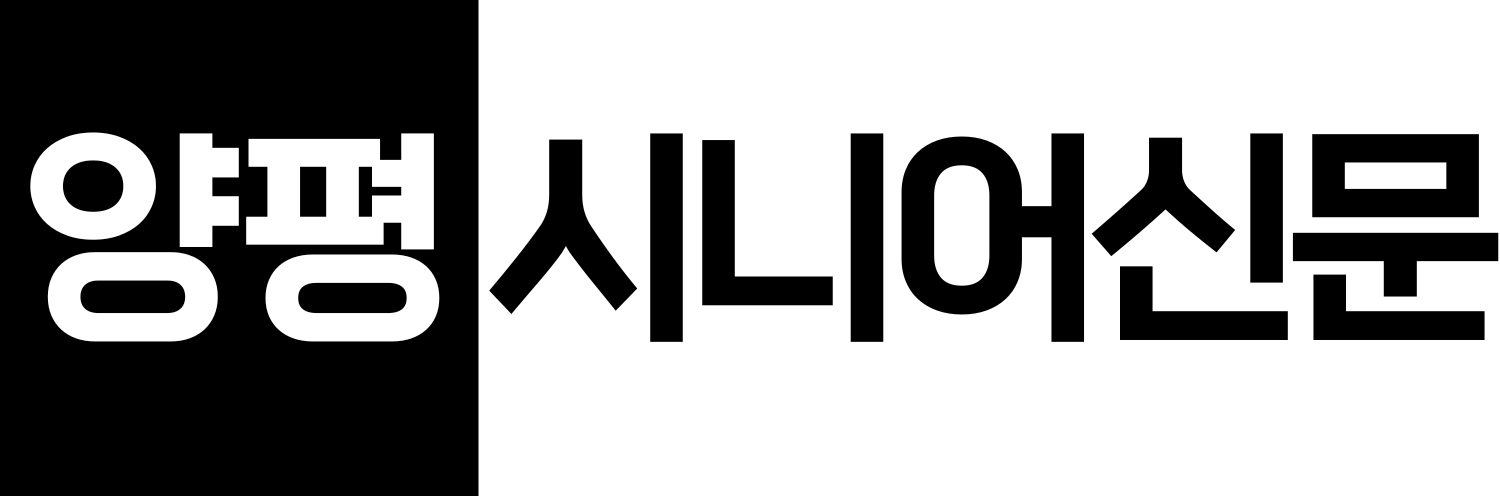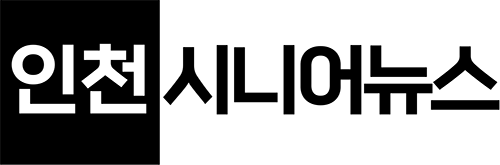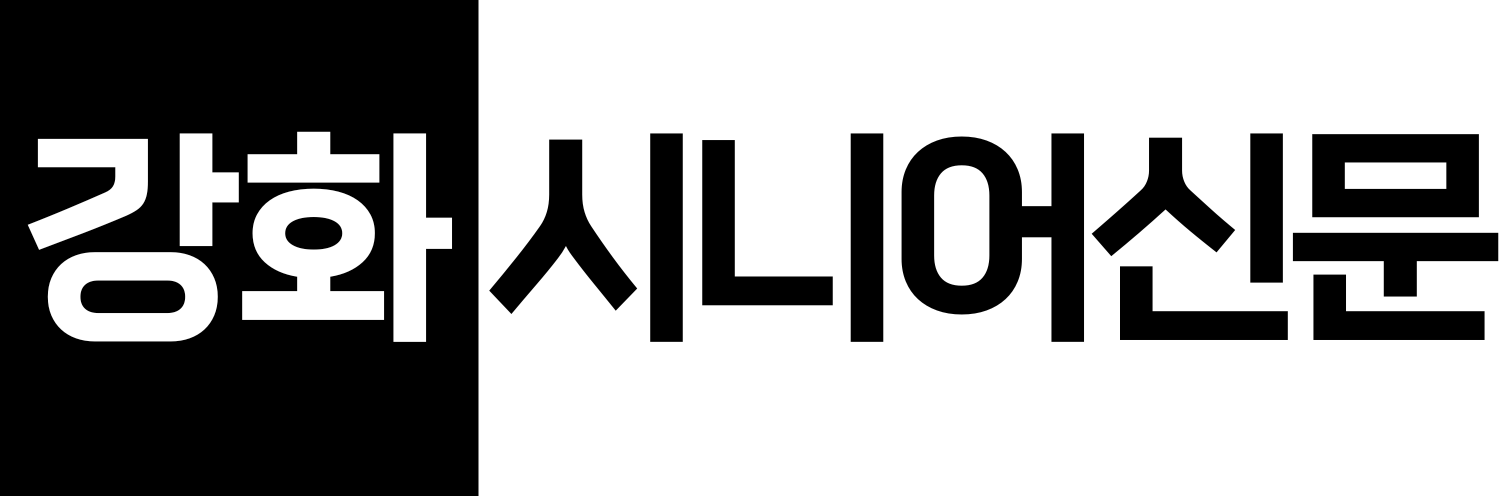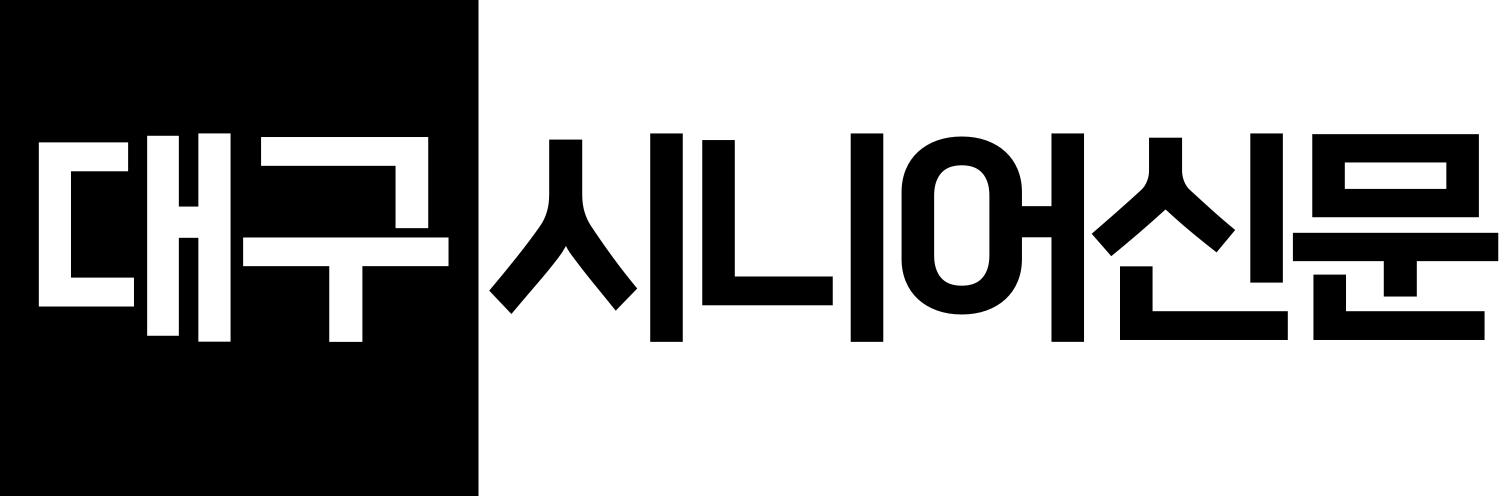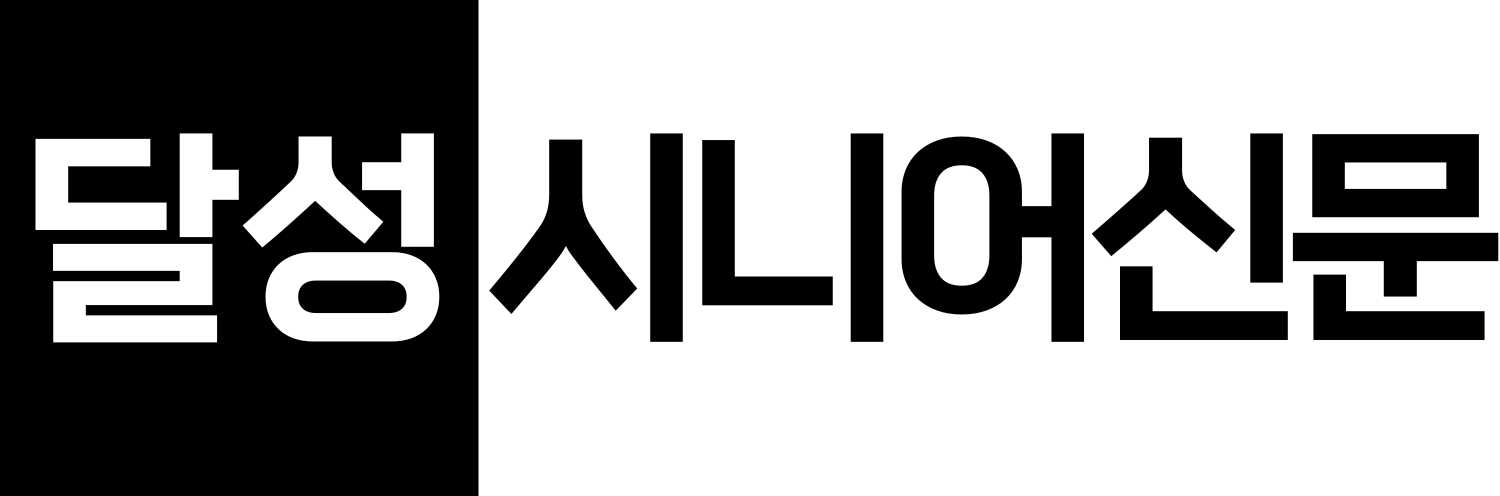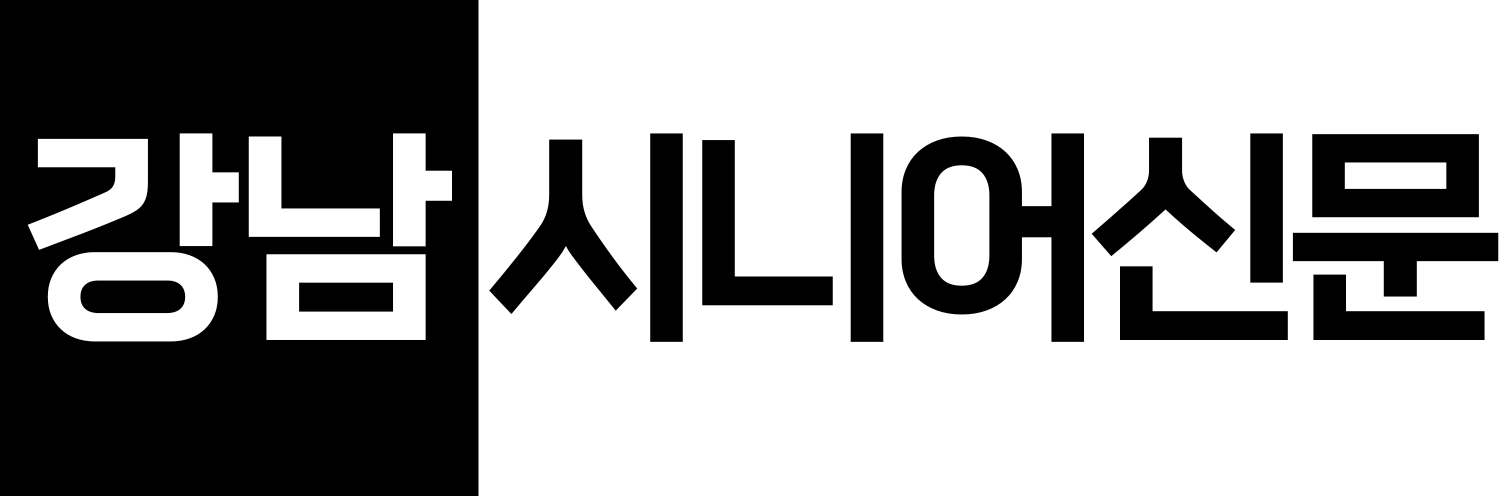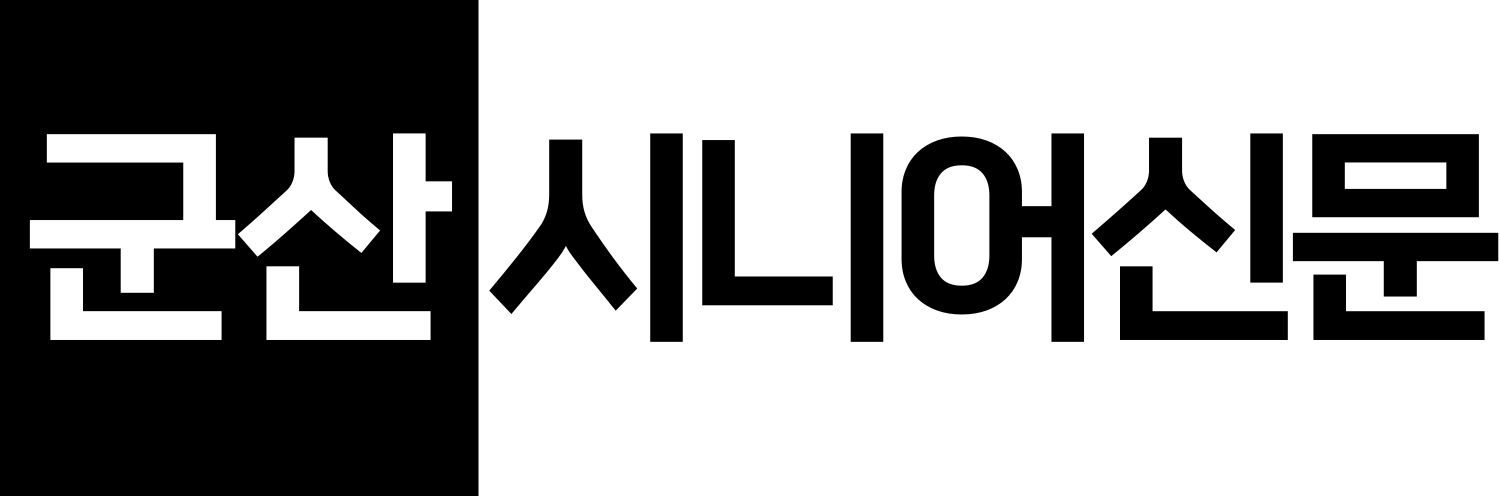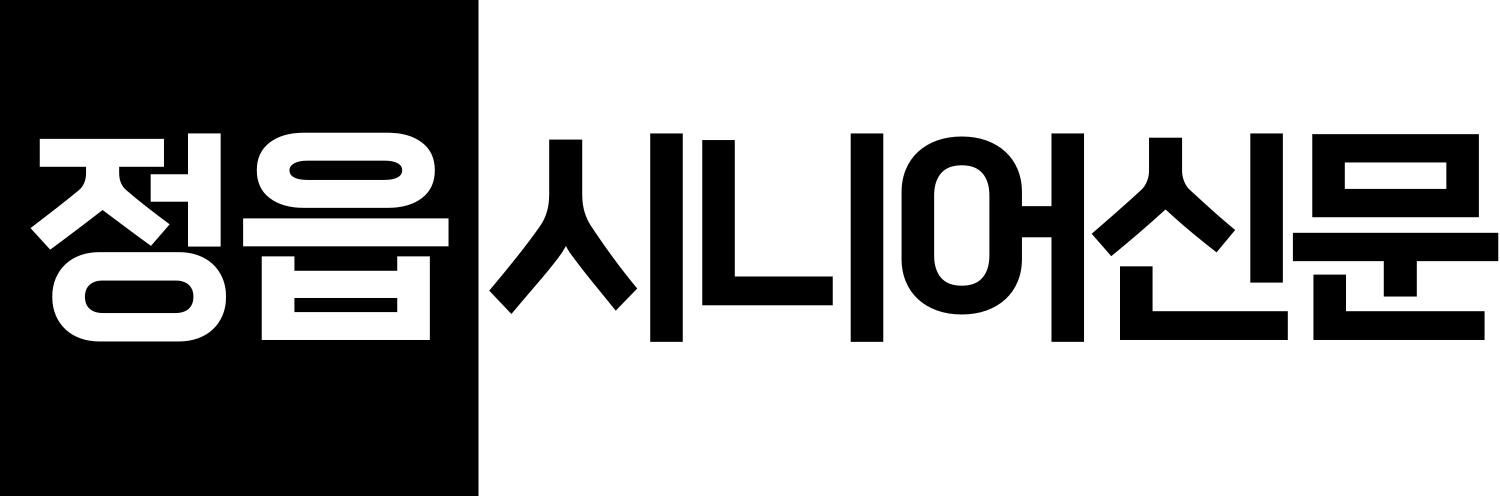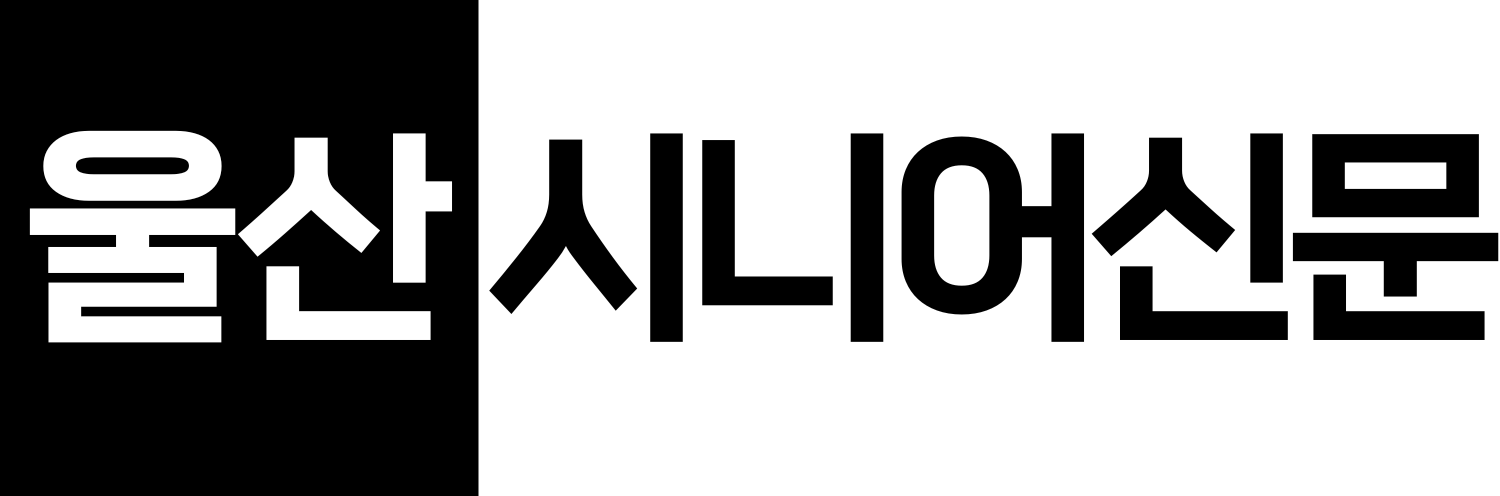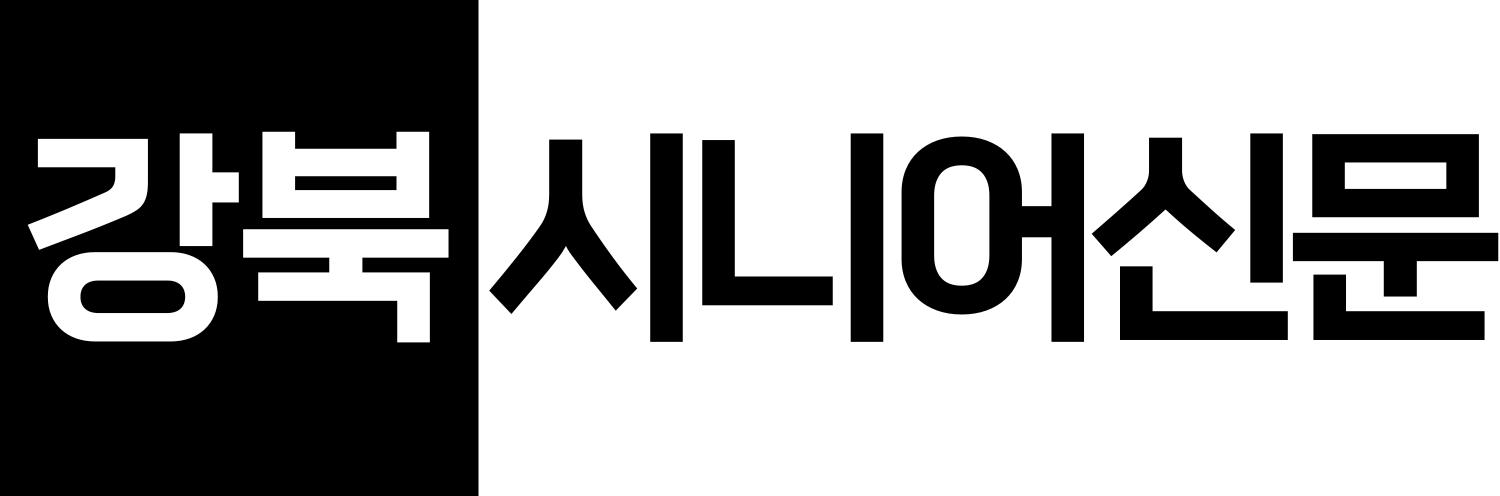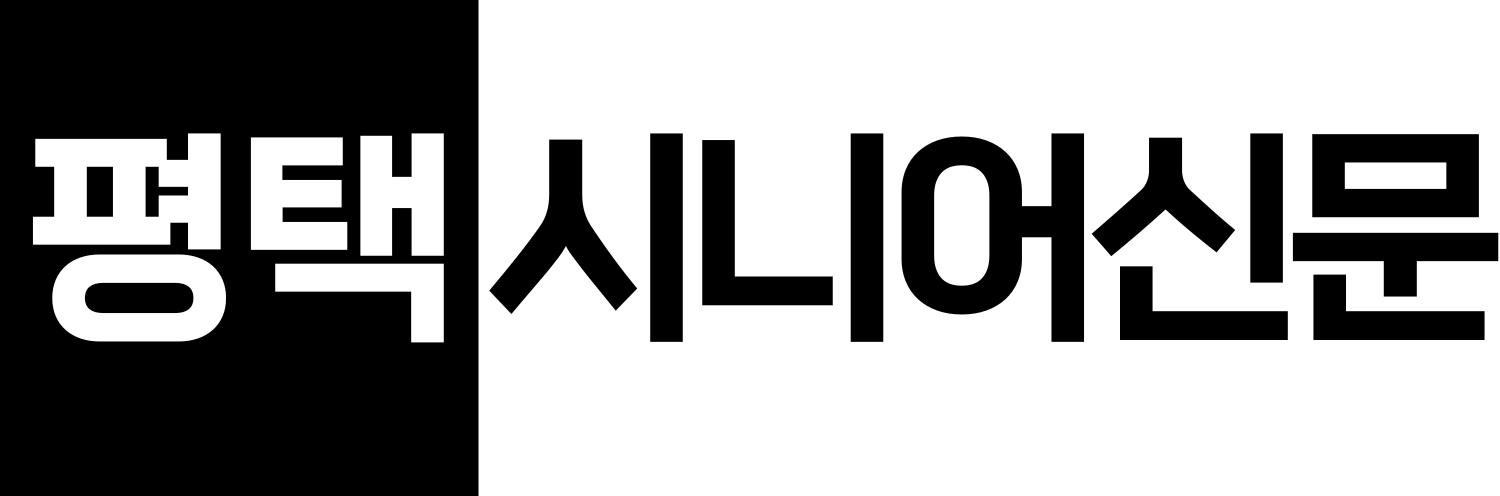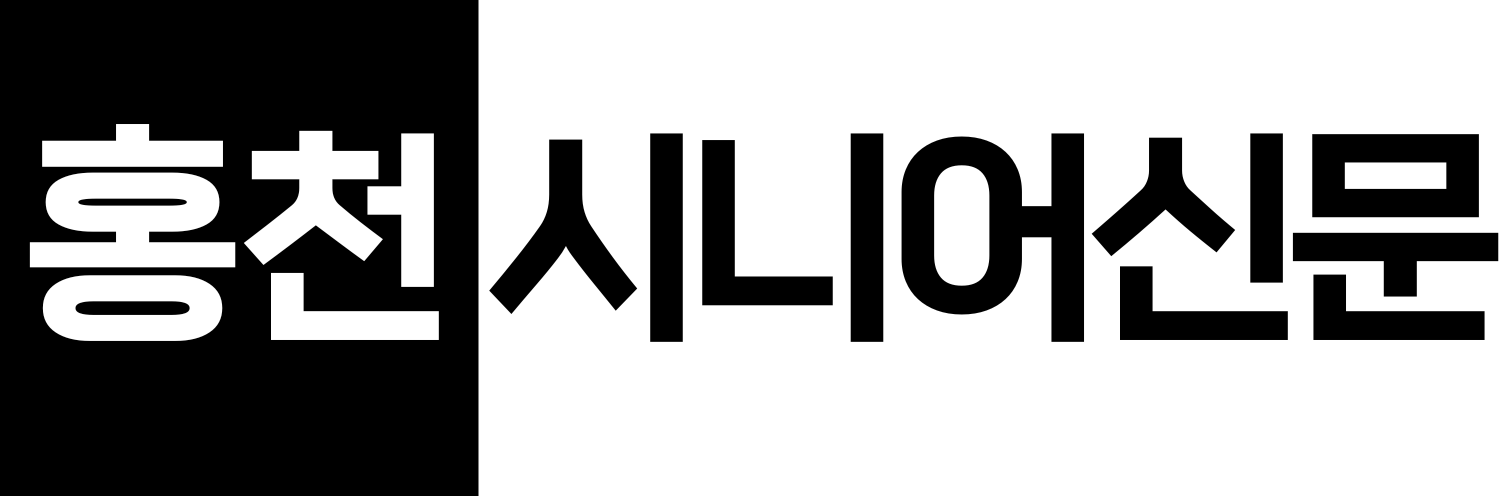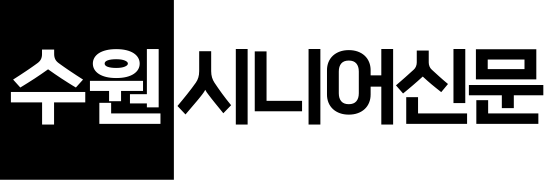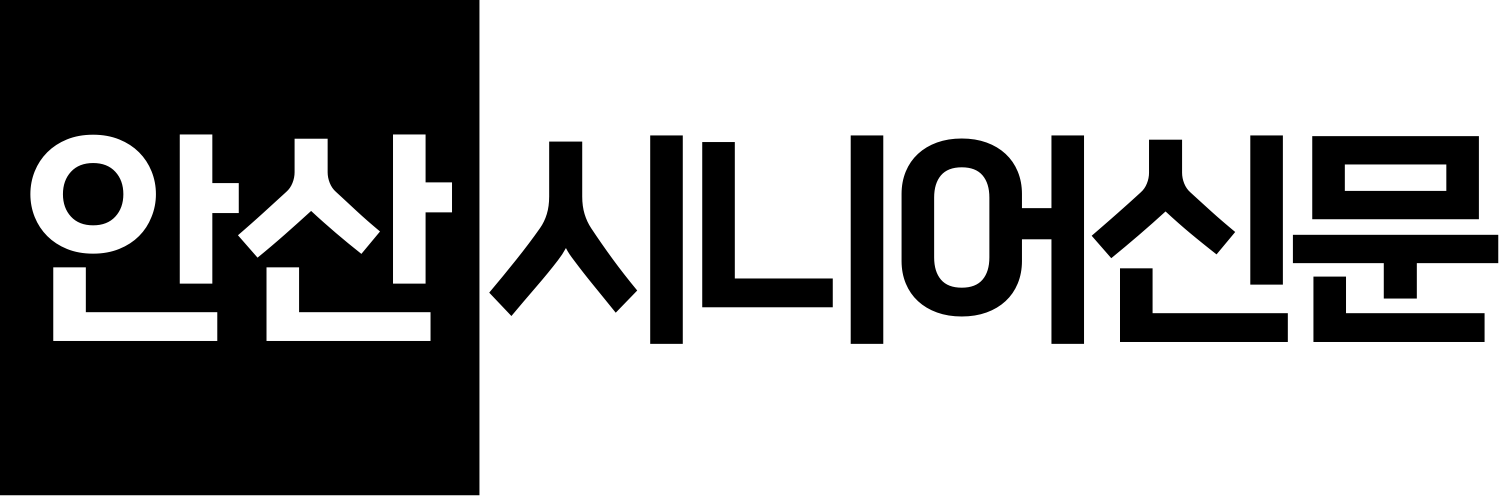일주일 만에 시골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음이 바빠진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채송화가 문득 걱정된다. 물 한 모금 없이 견뎌낸 일주일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길었을까. 그러나 곧 미소가 번진다. 채송화의 질긴 생명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채송화에 물을 주는 것이다. 바짝 마른 흙 위로 물이 스며들면서 오므라들었던 꽃잎들이 서서히 생기를 되찾는다. 노란색·빨간색·분홍색 꽃망울들이 하나둘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덩달아 환해진다.
어릴 적 온 동네 울타리 밑과 집집마다 꽃밭은 온통 채송화 천지였다. 별다른 손길 없이도 스스로 씨를 뿌려 해마다 더 많은 꽃을 피워내던 채송화 사이로 맨발로 뛰어다니던 시절.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흙의 따스함, 꽃잎을 따서 손톱에 물들이던 놀이들. 채송화를 마주할 때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가는 듯하다.
그때는 몰랐다. 작은 꽃잎 하나를 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내는지를. 뜨거운 여름 햇볕도, 며칠간의 가뭄도, 잊혀짐조차 말없이 받아들이며 제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그 의미를.
이제 나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한다. 채송화는 화려하지 않다. 장미처럼 우아하지도, 백합처럼 고결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 소박한 빛깔 속에는 삶의 온갖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노란 꽃잎은 기쁨을, 붉은 꽃은 열정을, 연분홍 꽃은 부드러운 위로를 전한다.
화분 사이로 자라난 잡초를 뽑아주며 문득 깨닫는다. 채송화는 불평하지 않는다. 목마름도, 외로움도, 잡초와의 경쟁도 묵묵히 견뎌낸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꽃을 피운다. 누가 봐주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 소박함에서 더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채송화의 모습에서 나는 삶의 진짜 모습을 본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굳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시들어도, 때로는 꽃이 적어도, 그래도 계속 피어나면 된다.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작은 꽃 하나하나가 피어날 때마다 나의 일상도 함께 피어난다. 소박하지만 단단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채송화 같은 삶. 그것이 바로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다.






![[기자수첩] 삶의 노래로 피어나는 시니어 문화…‘전남 시니어 향토문화경연’을 보고](https://naju-senior.com/wp-content/uploads/2025/11/기자수첩-문화원행사-218x15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