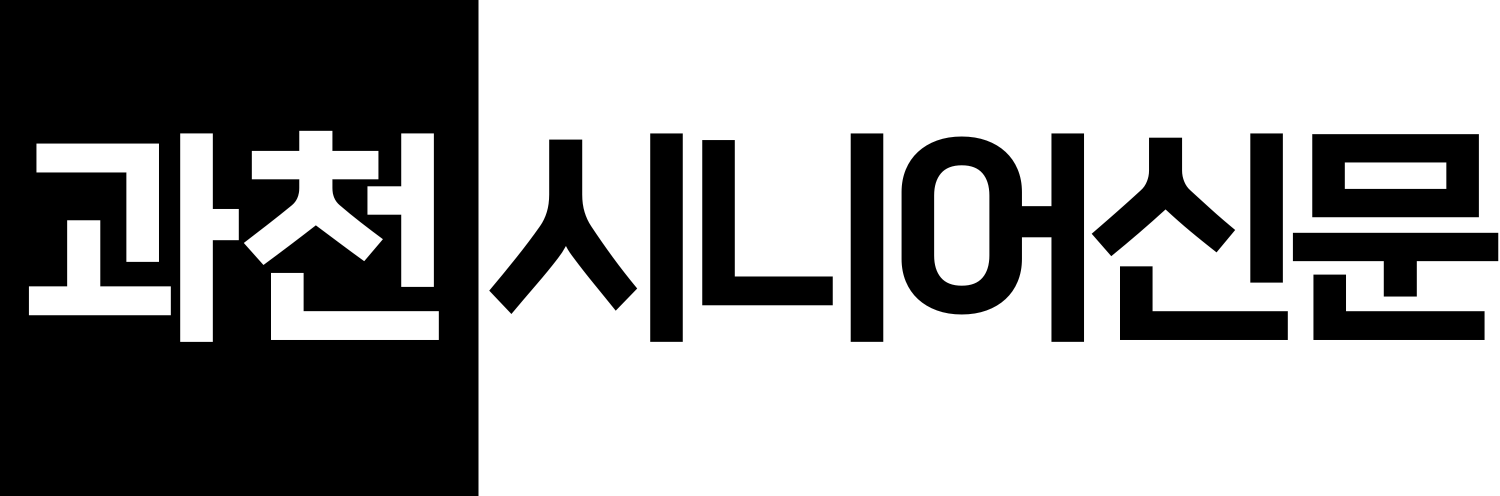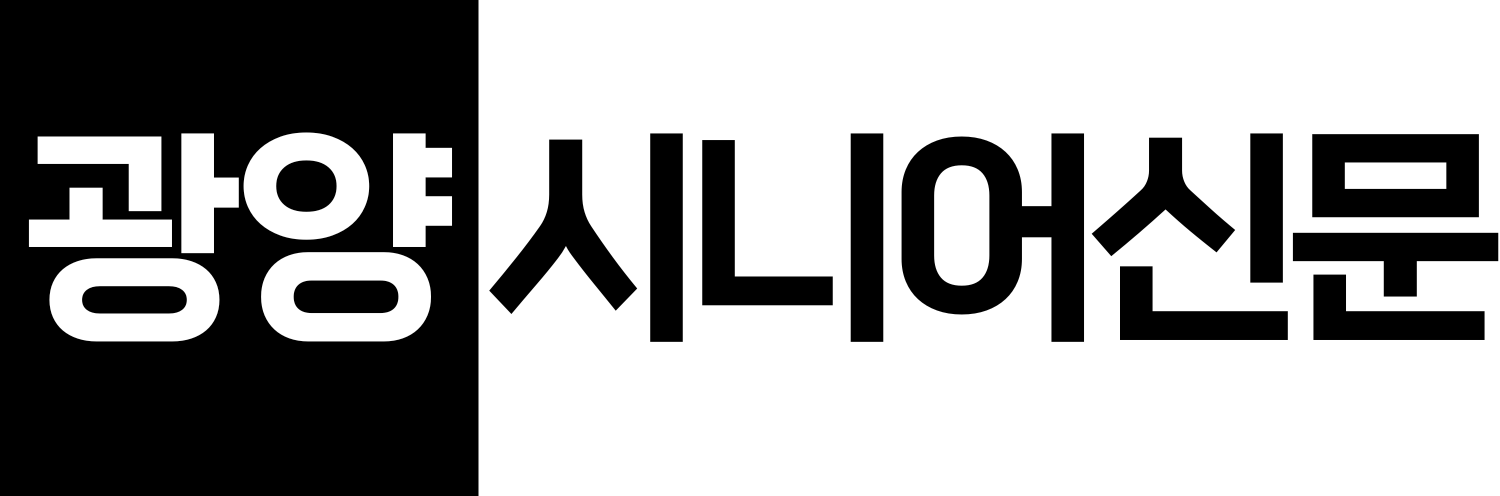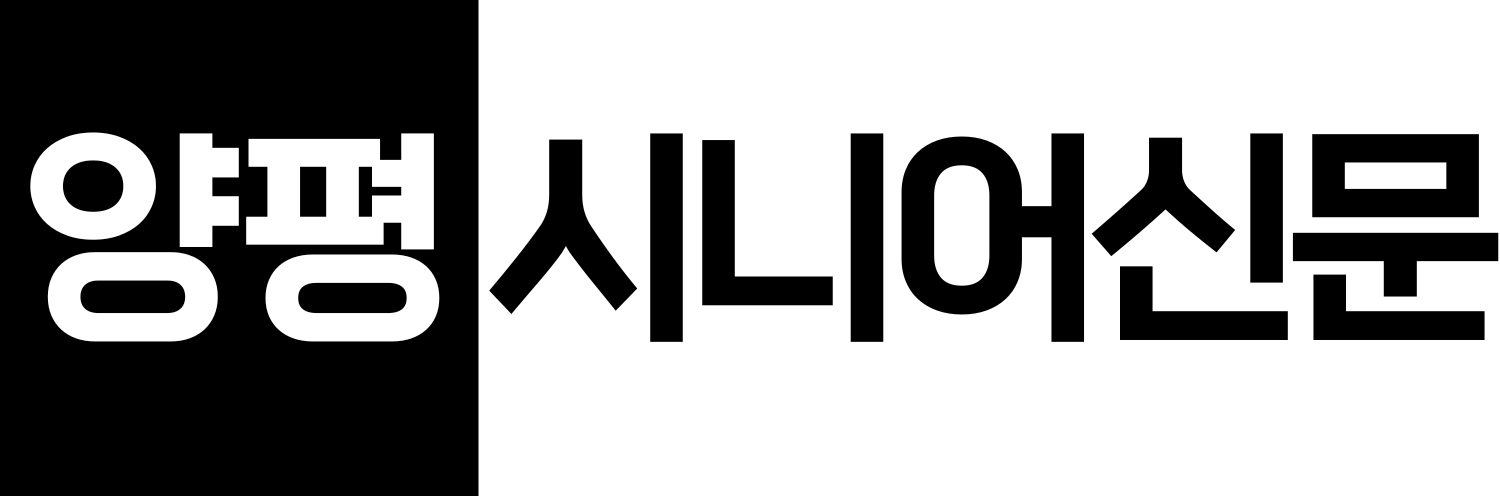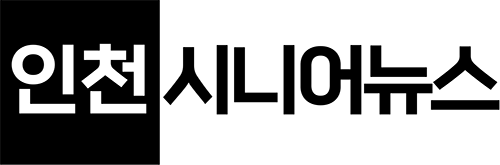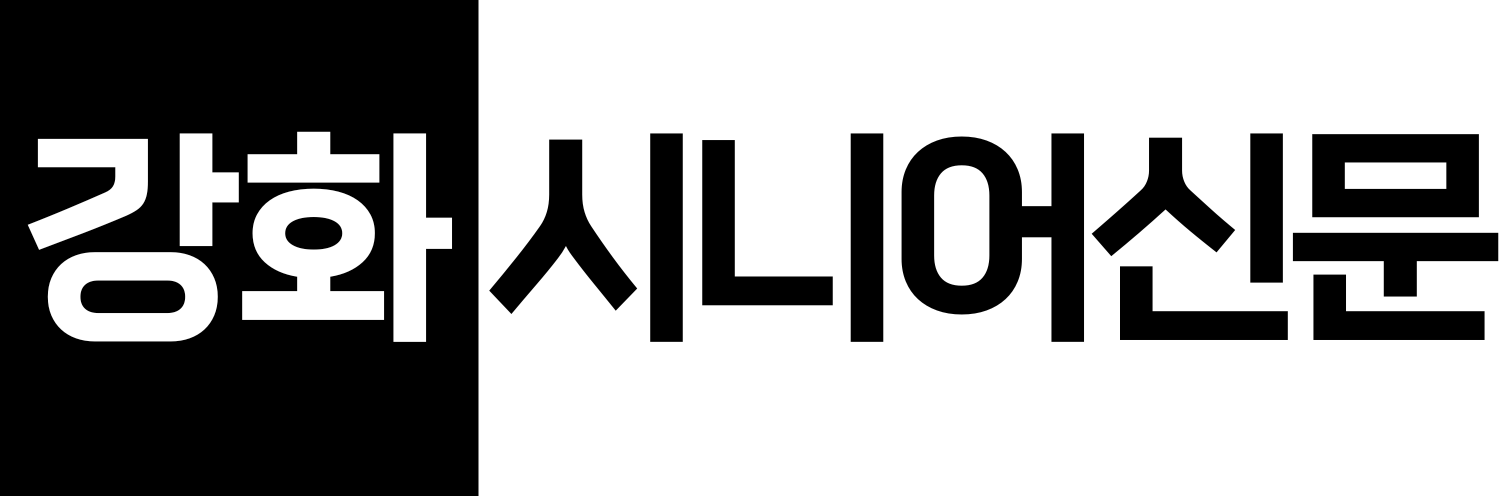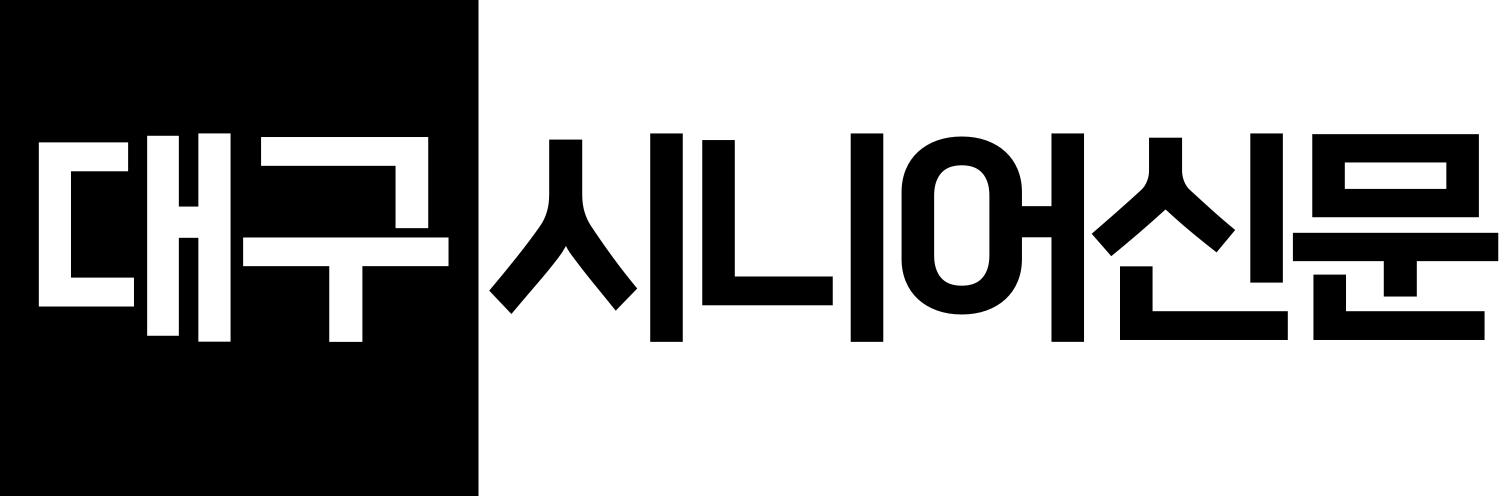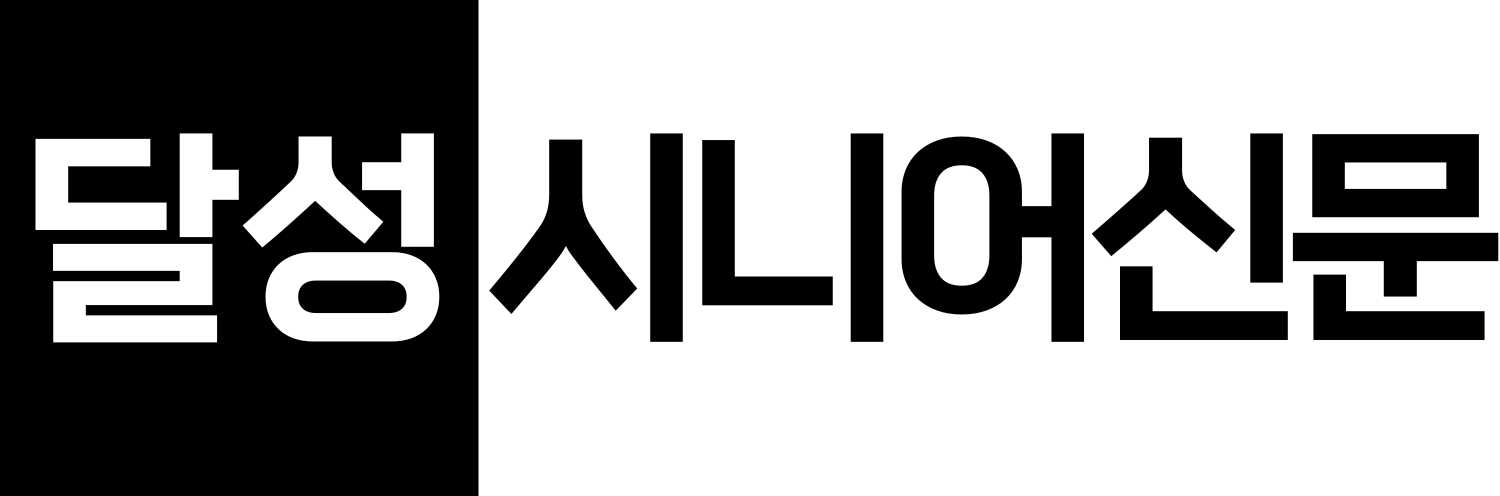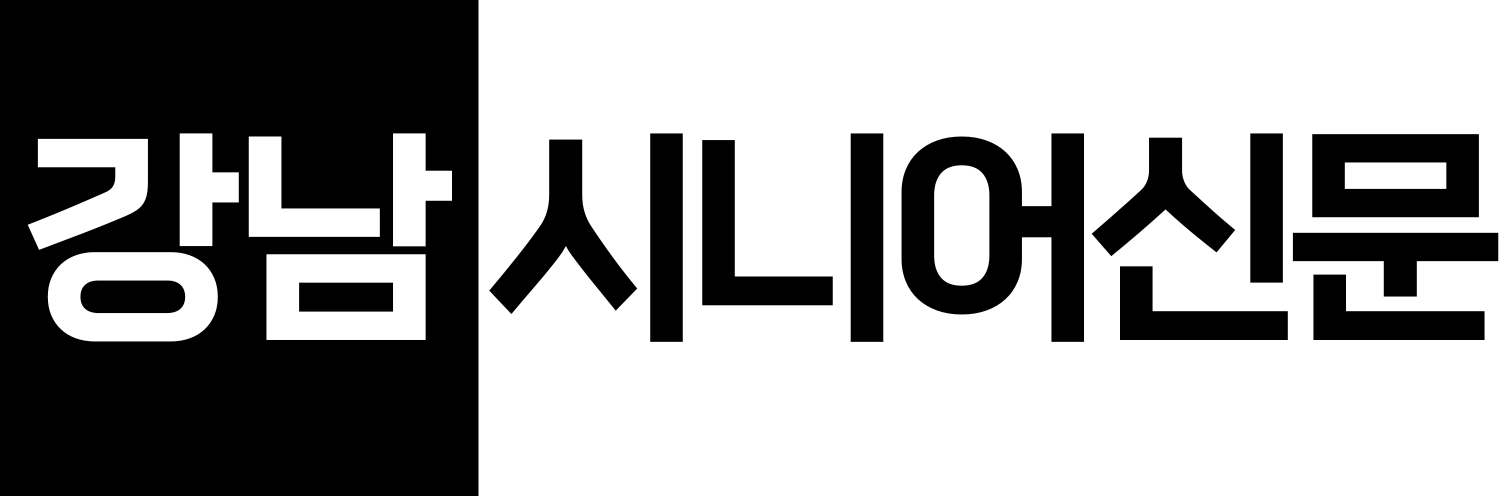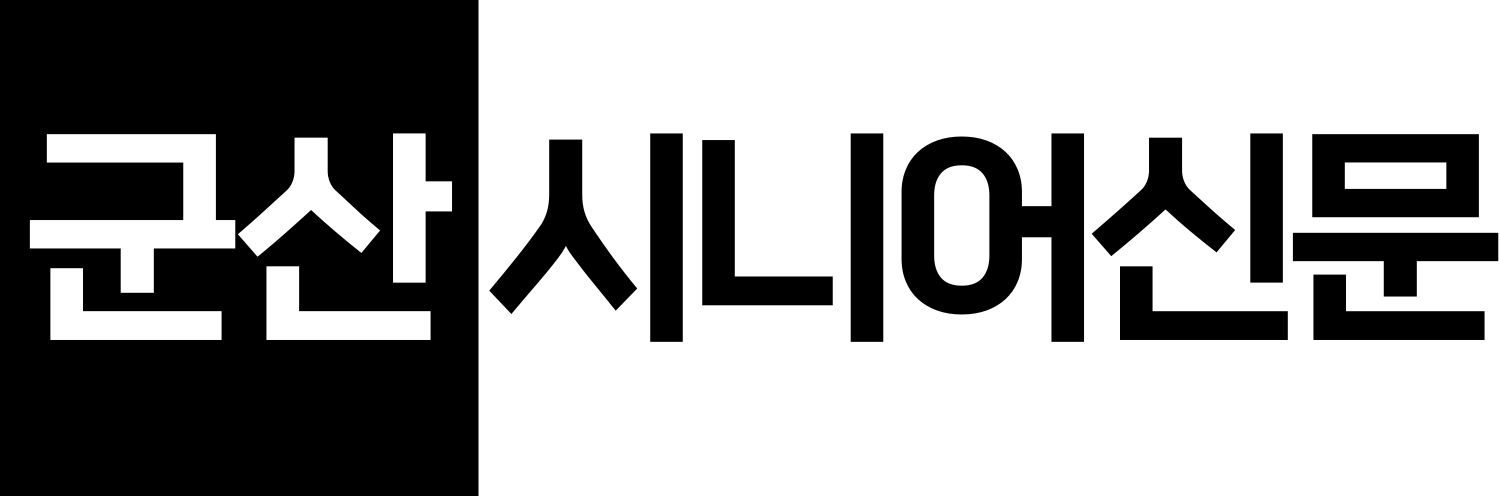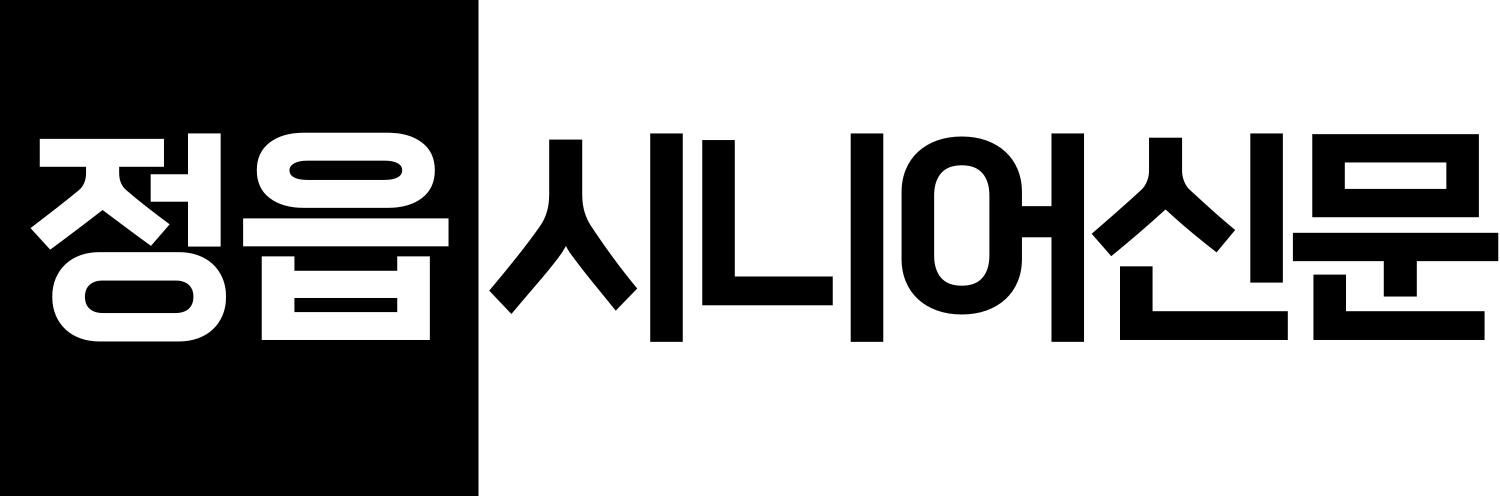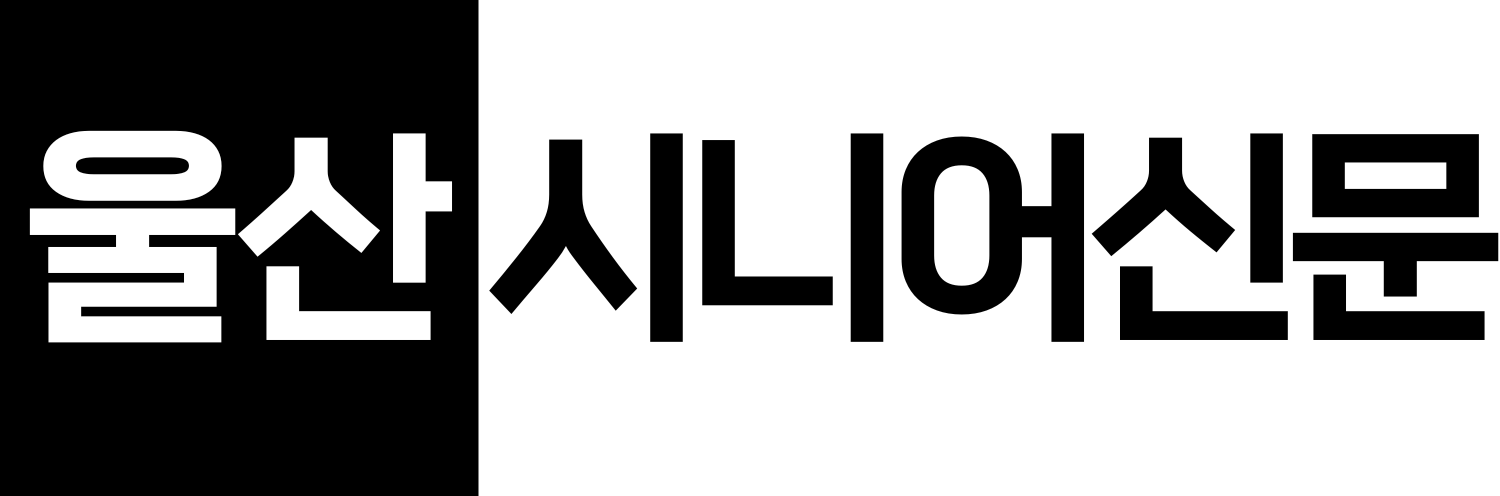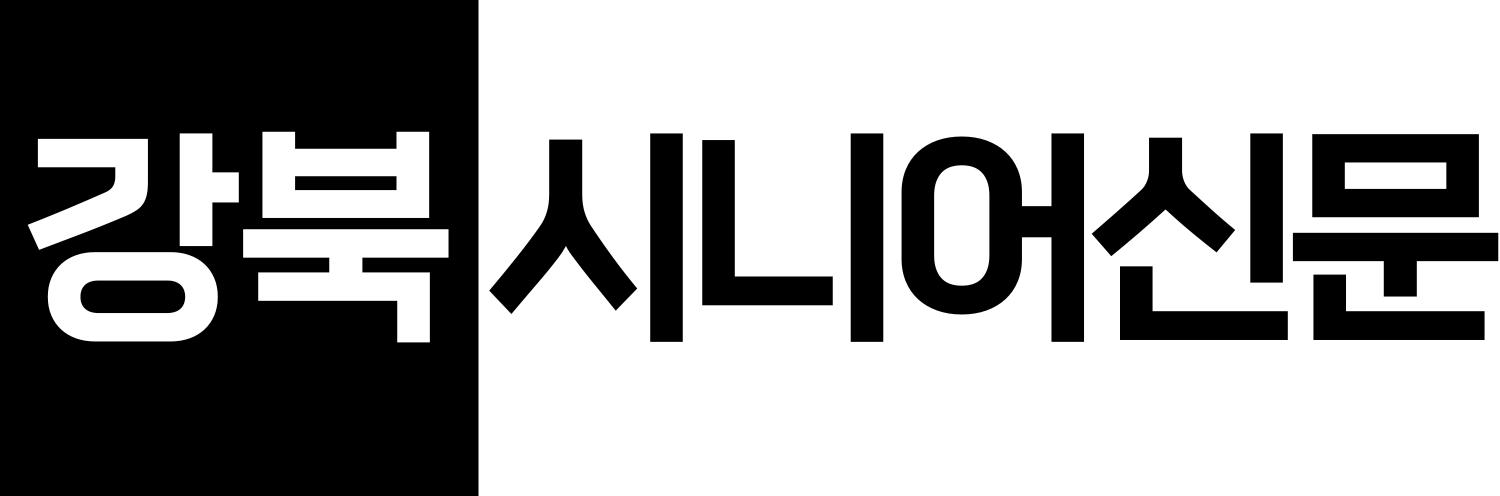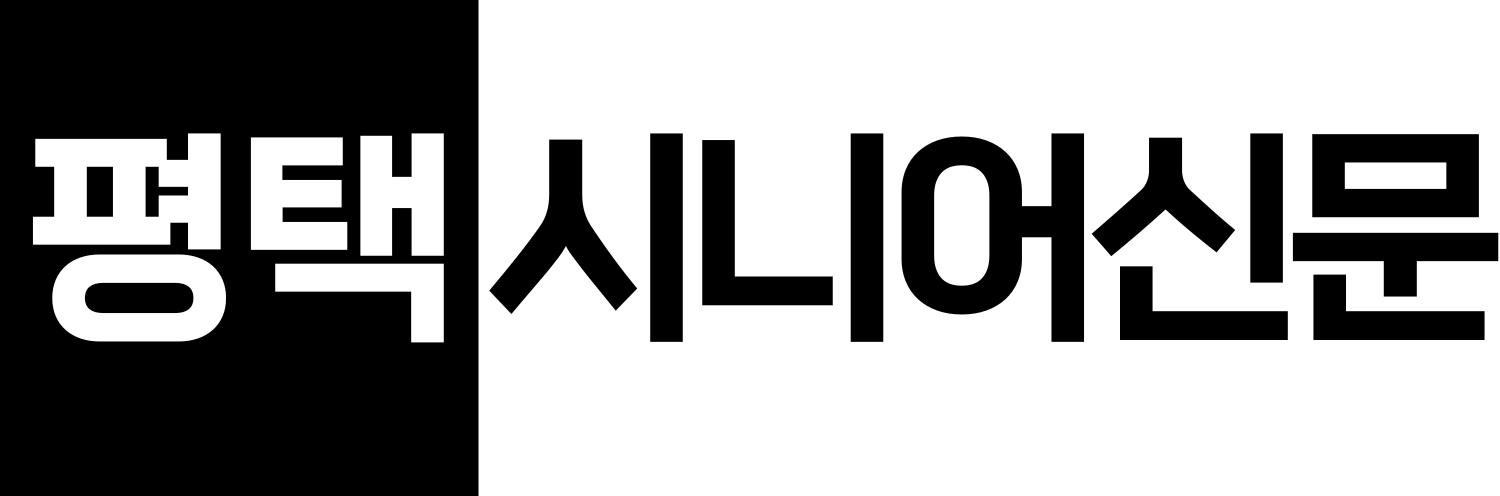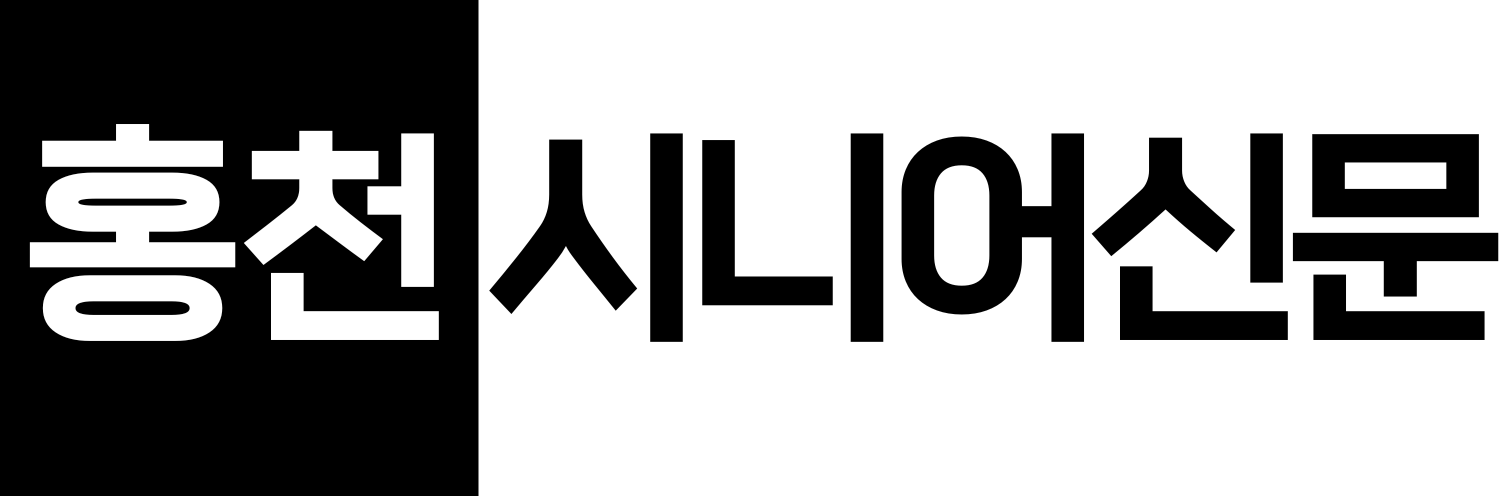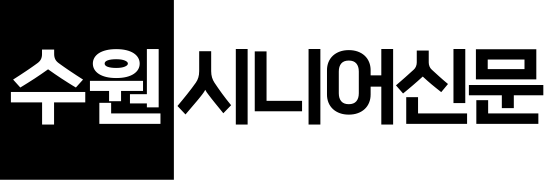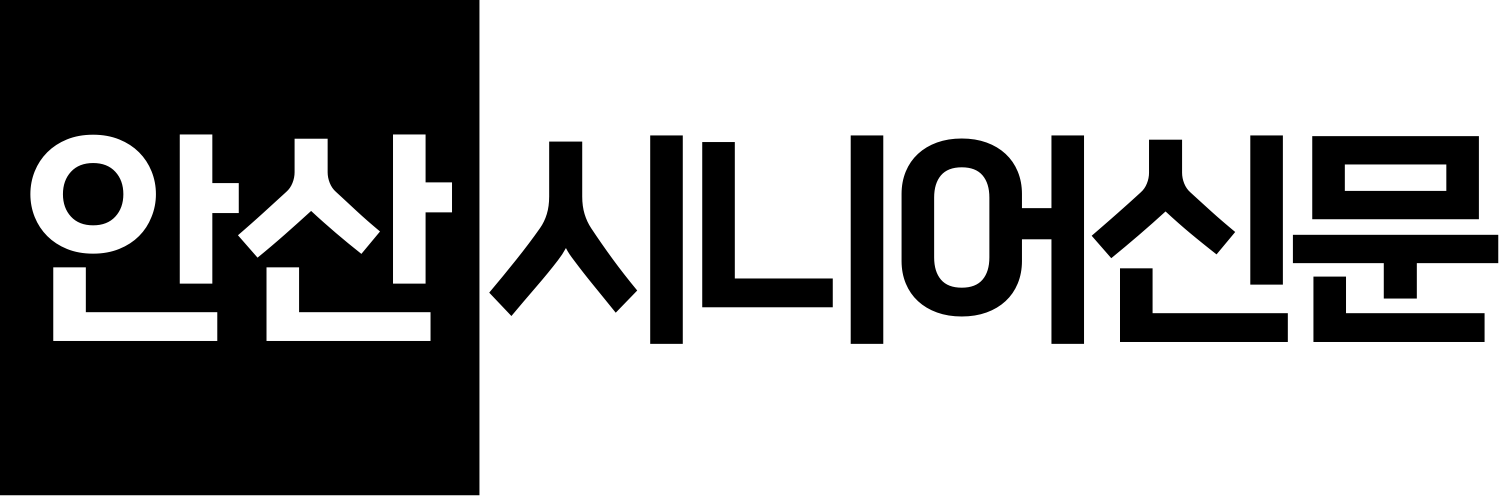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 생긴 셈이다. 아파트 단지 바깥쪽으로 이어진 작은 도로를 따라 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발걸음이 멈췄다. 이 길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40여 년 전, 이곳에 처음 심어졌을 때는 보잘것없는 묘목이었을 가로수들이 이제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채 울창한 초록 터널을 이루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본 가로수길은 마치 시간이 정성스럽게 그려낸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그 시절을 상상해본다. 가느다란 줄기에 앙상한 가지 몇 개를 겨우 뻗고 있었을 어린 나무들의 모습을. 누군가의 정성 어린 손길 아래 뿌리를 내리고, 첫 봄을 맞아 솟아난 연둣빛 새잎을 자랑스럽게 내보였을 그 시절을.
쭉 뻗은 가로수길 위에 마음을 맡기고 조용히 걸어본다. 이 나무들이 지켜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새벽 안개를 뚫고 조깅하던 사람들, 꽃다운 나이에 희망을 품고 학교로 향하던 아이들, 하루의 피로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던 직장인들, 평생을 함께한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던 노부부들…
수많은 발걸음이 이 길 위에 추억을 새겼고, 나무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가슴에 품은 채 묵묵히 자라왔을 것이다.
나 역시 언제부턴가 이 길을 걸었고,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수많은 가로수길을 지나왔을 것이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이 가로수들처럼 나도 함께 나이를 먹어온 셈이다. 나무들이 해마다 나이테를 새기듯, 나 또한 삶의 길 위에서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의 계절들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지금에 이르렀다.
봄이면 생명의 환희를 담은 새순이 돋고, 여름에는 지친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며, 가을에는 원숙한 단풍으로 물들었다가, 겨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묵묵히 다음 봄을 기다리는…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켜온 이 나무들을 보며 내 또래 시니어들이 떠올랐다. 그분들도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가정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직장에서는 성실한 일꾼이었으며, 사회에서는 조용한 봉사자가 되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 흔들리고, 메마른 현실의 가뭄에 목이 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며 견뎌냈다. 그렇게 오늘의 우리가 되었다.
가로수 한 그루가 살랑이는 바람에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인다. 마치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것 같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이 들리는 듯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 길이 주는 선물, 나무들이 전해주는 위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한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다.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가로수들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하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음에,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나무들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터가 되며,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빛이 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이다.






![[기자수첩] 삶의 노래로 피어나는 시니어 문화…‘전남 시니어 향토문화경연’을 보고](https://naju-senior.com/wp-content/uploads/2025/11/기자수첩-문화원행사-218x150.png)